
(CNB저널 = 이한성 동국대 교수) 떡이 맛있는 동양방앗간 앞은 길이 좌우로 갈라진다. 백사실을 찾아가는 길은 우측 북악산에 가까운 길이다. 가는 길에는 언제부터인가 하나 둘 늘기 시작한 카페와 찻집이 자리 잡고 있다. 담벼락에 누군가 페인트로 苦盡甘來(고진감래)라 써 놓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친절하게 인생길을 알려 주고 있다. 그리고는 백사실 가는 길도 간단히 화살표로 그려 놓았으니 어설프기는 하지만 센스가 있다.
길이 지루할 때쯤 드라마의 배경으로 쓰여 유명해진 커피 집을 만난다. 데이트하는 젊은이들이나 관광객들이 언제나 많이 찾는 집이다. 연전(年前) 막내딸에게 데이트 신청하여 와 보았는데 커피 값은 비싸지만 젊은이들이 데이트하기에는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사실 중년 이후의 시니어가 되면 새로운 도전을 꺼려한다. 음식도 설렁탕, 추어탕, 칼국수 그런 유(類)에 머무르려 하고 퓨전(fusion)이나 새로운 시도에 인색하다. 그런데 ‘안 해 본 것 해 보기’도 할 만한 일인 것 같다.
인생사 중 손해 가장 적은 일은?
각설하고, 길을 따라 가다 보면 좌측에 응선사(應禪寺)라는 절을 만난다. 벽에 붙여 놓은 글에 ‘공부하다 죽어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이 적혀 있다. 곰곰 읽어 보니 10 대 종정 혜암스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수지맞는 일 중 하나가 공부하다 죽는 일’이라는 말씀이었다. 그렇네. 그다지 손해날 일은 아닌 듯하네.

조심스레 절 안으로 들어가 보면 법당 좌측에 빼어난 산신 탱화가 걸려 있다. 2003년 서울시 문화재 자료14호로 지정된 소중한 그림이다. 1914년 고양군 삼각산 안양암에 봉안되었던 산신도였다는데 그곳이 어디일까? 지금도 불교박물관 역할을 하고 있는 낙산 아래 창신동 안양암일 것이다.
일제 강점기 때만 하더라도 서울의 동북쪽은 양주군, 한강 이남 동쪽은 광주군, 한강 이남 서쪽은 시흥군, 서울시(경성시)를 제외한 지역은 고양군이었다. 그러니 서울 가까운 동쪽, 남쪽, 서쪽, 북서쪽은 대부분 고양군이었다. 이 그림에는 발원문이 적혀 있어 그 내력을 알 수가 있다.
“대정 3년 갑인(1914년) 음력 10월 8일 새로 산신탱 1점을 그려 경성부 고양군 삼각산의 안양암에 봉안하노라. 인연 일어난 바, 증명에 연응정순, 송주에 만월법원, 남신도 김정□, 오보광, 이광명이며, 지전은 남신도 백련심이다. 금어(그림 그린 화승)는 금호약효, 향암성엽, 연암경인, 다각은 사미승 경협이며, 공사는 남신도 강탄연, 도감은 평등선주, 별좌 겸 화주는 양학효신이다. 시주자 명단 여신도 병진생 이씨 정진행, 남신도 정축생 이씨, 여신도 경진생 김씨, 여신도 갑신생 김씨만□, 동자 기유생이□□, 동자 임자생 이성길.
大正三年甲寅陰十月初八日新綵繪山神幀一軸奉安于京京城府高陽郡三角山安養庵 緣化所證明 淵凝淨旬 誦呪 滿月法圓 信士 金正□ 信士 吳普光 信士 李光明 持殿 信士 白蓮心 金魚 錦湖若效 香庵性曄 蓮庵敬仁 茶角 沙彌景協 供司 信士 康坦然 都監 平等善柱 別座 化主 養鶴孝信 施主秩 信女 丙辰生李氏正眞行 乾命 丁丑生李氏 信女 庚辰生金氏 信女 甲申生金氏萬□ 童子 己酉生李□□ 童子 壬子生李成吉“
당대를 대표하는 금어(金魚: 화승) 3인이 그렸다. 시주자 중에는 당시 6살배기 기유생 이OO, 3살배기 임자생 이성길도 있다. 두 아들 무탈하게 자라기를 기원한 엄마 아빠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림이라 한 번 더 눈길이 간다.

탄핵 중 노무현 대통령이 걸었다는 백사실
이제 안내판을 따라 막다른 길 우측으로 꺾어지면 이윽고 별천지 백사실로 들어서게 된다. 서울 북쪽 북악산 북록(北麓)에 숨겨진 비경이다. 산 좋고 물 좋고 포근한 느낌까지 어쩌면 서울 품속에 이런 곳이 숨겨져 있었을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당했을 때 주로 소일하던 일이 북악산 산행이었다는데 이곳에 들렀던 노 대통령도 이 비경에 매료되었다고 전해진다. 입구에서 잠시 내려가면 우측 큰 바위에 ‘白石洞天’이라는 해서체(楷書體) 정자로 반듯하게 쓴 글씨가 나타난다. 안내판도 서 있는데 ’백석은 백악(북악산)을 뜻하고 동천은 산천으로 둘러싸인 경치 좋은 곳을 말한다. 따라서 백석동천은 백악의 아름다운 산천으로 둘러싸인 경치 좋은 곳‘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동천은 일반명사이니 그렇다 치고 백석(白石)이 과연 백악(白岳)일까? 그렇다면 그대로 백악동천으로 하면 쉽지 않았을까? 의문을 가지고 계곡으로 내려가면 졸졸졸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곁에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는 연당(蓮塘)과 연당에 다리를 걸치고 있는 육각 정자 초석, 언덕 위에 가지런한 집터 주춧돌이 아련한 과거의 시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언제 누가 살던 별서(別墅: 농막, 작은 별장) 터였을까? 한 때는 백사실이라는 이름에 매여서 백사(白沙) 이항복의 별서 터가 아닐까 추정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2012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서울시 발행 동명연혁고(洞名沿革攷), 연암의 손자 박규수의 환재집, 추사의 완당전집에서 자료를 모아 추론하여 “추사 김정희 집안의 소유가 되었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사안은 완당(추사 김정희의 호 중 하나)전집에 근거를 둔 것이다. 그 시구 중에

舊買仙人白石亭(전에 산 선인의 백석정)이라는 시구와 그 주석에, 謂余北墅 有古白石亭舊地(내 북쪽 별서는 옛 백석정 옛터에 있다)라는 내용인데 경복궁 옆에 있던 추사의 집에서 보면 북쪽 별서였기에 北墅(북서)라 한 것이다. 이리 보면 추사가 유배되기 전까지는 백석정 일대는 추사의 소유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면 추사가 매입하기 전 옛 백석정은 누구의 소유였을까?
통의도시연구소장 최종현 님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숙종 대에서 영조 대까지 살았던 문필가이자 서화가 연객(煙客) 허필(許佖: 1709~ 1761)이라고 한다.
그는 강세황을 비롯해 이 시대 문인, 화가들과 교류한 사람으로 속세를 떠나 신선 같은 이미지를 가진 인물이었다 한다. 일반적으로 진인(眞人: 道人) 스타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곳 백석동천에 모옥(茅屋: 초가)을 짓고 고요히 살던 인물이었던 것 같다. 그의 시 중에 1737년,
‘漢南 白石別業 與鄭運德潤 及豹菴 同賦(북한산성 남쪽 백석별업에서 운덕 정윤 및 표암 강세황과 함께 부(賦)를 짓다)’라든지, 연암 박지원의 손자 박규수의 환재집 속에 시 惆愴白石亭(추창백석정: 처연한 백석정)이라는 시의 설명에 ‘석경루 뒤쪽에는 수석이 매우 기이한데 그 위로 백석정 옛터가 있다. 세상에서 전하기를 허씨 성 진인이 머물던 곳인데 어느 때 진인인지는 알 수 없고 도홍경이나 환진인 같은 유였을 것이다(石瓊樓北泉石甚奇 上有白石亭舊地 世傳許眞人所居 眞人不知何代人 陶桓流也)’라고 한 정황으로 볼 때 허필이라는 이가 한 때 운영하던 별업(別業: 別墅)이었을 것이다.
또 하나 재미있는 자료는 2012년 이미 밝혀진 1935년 7월 19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백석정(白石亭) 사진이다. 이 자료로 인해 우리는 초석만 남은 연당(연못)가 육각정(六角亭)의 생생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북악팔경을 소개한 내용인데 기자나 데스크가 아차 실수하여 육각정을 팔각정으로 소개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작은 재미를 준다.
시 한 수 읊고 싶게 만드는 연못가 정자 터
이제 별서터 주춧돌에 앉아 연당을 내려다본다. 비라도 흠뻑 내린 다음날 가 보면 연당에는 물이 그득 고인다. 개구리들도 개굴개울 울어댄다. 갑자기 백석정이 살아난다. 벗들과 한 잔 나누면서 시라도 한 수 읊고 싶다. 눈 들어 앞 산(서쪽 언덕)을 바라보면 정상 가까운 곳에 큰 바위가 있다. 월암이라고 부른다. 잠시 수고로움을 무릅쓰고 오르자. 거기에는 힘차게 써내려간 月巖(월암)이라는 반듯한 해서체 글씨가 기다리고 있다. 달 밝은 밤, 이 별서의 주인들은 그곳에 올라 달을 벗 삼았을 것이다.


이제 계곡을 따라 내려간다. 서울시에서는 이곳을 명승 36호,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서울 시내에서는 드물게 도롱뇽 서식지로 보호받고 있다. 골짜기가 끝날 무렵 흰 바위 지대가 나타나면서 폭포수가 떨어진다. 곁에는 일붕선원 산하의 현통사(玄通寺)라는 절이 자리 잡고 있다.
여기서 잠시, 순조 대에서 고종 대까지 살다간 성균관 대사성 미산 한장석(尾山 韓章錫) 선생의 시 한 편 읽고 가자. 미산집 2권에 실려 있는 시(詩)인데, ‘백석실을 홀로 유람하고 삼일을 묵고 돌아왔네(獨遊白石室三宿而還)’ 라는 내용이다. 여기서 우리는 백사실이라는 지명이 백석실(白石室)이 변한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긴 시 중에 일부만 추렸는데 시의 내용은 이렇다.
십년간 한북문(홍지문)에 나서지 않았는데 (不出十年漢北門)
붉은 꽃 뜬 물 아득히 흐르니 다시 근원 찾았네 (紅流杳去更尋源)
봉우리 돌고 개울 굽은 여기는 어느 곳인가 (峯廻溪轉此何境)
개 짖고 닭 우는 또 한 마을이 있네 (犬吠鷄鳴又一村)
숲과 못의 그윽한 일은 봄이 온 후에 좋고 (幽事林塘春後好)
세월의 참된 기미는 고요함 속에 있네 (眞機日月靜中存)
내 마음의 즐거움을 함께 말할 사람 없고 (無人共道余心樂)
부용목 끝 담박하다 말할 만하네 (木末芙蓉澹可言)
[중략]
백석에 여울은 날리고 산문은 닫혔는데 (飛湍白石鎖山門)
신선이 상류에 사시는 줄 알지 못하였네 (不識仙扉在上源)
물 위쪽에 누대 지으니 오솔길이 지나고 (壓水起樓仍細徑)
기슭 따라 나무 심으니 마을이 절로 깊어라 (緣崖種樹自深村)
이리저리 홀로 가니 시내 노인이 바라보고 (漫成孤○溪翁見)
이전 유람 아득히 느끼는데 벽의 글자 남아있네 (敻感前遊壁字存)
삼일간 묵고서 곧 벼슬 생각 잊었으니 (三宿頓忘金馬想)
못과 산악의 신령들이 함께 말을 듣는다네 (潭霛嶽祗共聞言)
(기존 번역을 부분 수정)
지금은 백사실을 창의문 쪽에서 찾아가지만 예전에는 그 길이 아마도 산속 오솔길밖에 없었을 것이다. 예전 사람들은 백사실을 잘 알지도 못했겠지만 아는 이가 찾아오더라도 세검정 쪽 개울 길로 오르는 게 일반적이었다. 미산 선생도 개울 따라 올라왔다. 무릉도원 찾아가듯 복사꽃잎 흘러내리는(紅流) 산길 물길을 돌아 백석실 계곡으로 접어든다. 아니 이런 계곡 안에 또 한 마을이 있다니…. 지금도 백사실 상류에는 그 마을 뒷골(요즈음 새로 능금마을이라 이름 지었음. 아쉽게도 능금나무는 없음)이 있다. 농사도 짓는데 특히 이곳 오이는 아삭아삭한 게 맛이 일품이다. 세검정 옆 구멍가게에 가면 오이 철에는 이 오이를 판다. 때때로 꼬부랑 오이도 있는데 애들 때 그 맛이다.


폭포에 이르니 흰 바위로 흘러내리는 여울이 날린다. 과연 백석실(白石室)이구나. 미산 선생이 폭포수 흘러내리는 흰 바위를 보고 백석실을 느꼈듯이 필자도 이 바위를 보면 자연스레 백석골짜기(白石谷)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모르기는 해도 백석동천의 백석은 백악이 아니라 이 바위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선생은 둘러보면서 벽에 글자가 남아 있음(壁字存)을 확인하는데 白石洞天 네 글자였을 것이다. 여기에서 백사실의 ‘실’에 대해 살펴보자. 일례로 한실마을, 닭실마을과 같이 ‘실’은 ‘谷’ 또는 ‘골’을 대신한 말이다. 백사실은 白石谷 또는 백석골과 같은 뜻이다. 미산 선생이 室로 쓴 것은 음(音)을 빌려다(假借) 쓴 것이다.
‘칼’자 들어간 세검정이 종이 문화의 본산 됐으니
골짜기를 따라 골목길을 내려오면 일붕 서경보 박사의 일붕선원을 지나 세검정(洗劍亭)에 닿는다. 흔히 인조반정이 성공한 후 반정공신 이귀(李貴), 김류(金瑬) 등이 칼에 묻은 피를 닦았다 해서 세검정이며 그 의미는 이제 더 이상 피를 볼 일 없는 평화 시대를 상징한다는 세간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다. 언제 누가 지었는지는 불분명한데 연산군이 탕춘대(蕩春臺)를 지으면서 유흥을 위해 지었다기도 하고, 숙종조에 북한산성을 쌓으면서 군사들의 휴식처로 지었다는 설도 있다. 영조 24년 (1748년)에는 고쳐지으면서 洗劍亭 현판을 새로 달았다.



1941년에는 정자 옆 종이 공장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는데 다행히 겸재 정선이 세검정을 그린 부채 그림이 남아 있어 이를 참고해서 1977년 다시 지었다. 또 소중한 사진이 한 장 ‘조선고적도보’에 남아 있는데 1883년 미국 천문학자 퍼시벌 로웰(Percival Lowell)이 촬영한 것이다. 이 사진 속 세검정은 겸재의 그림과 같은 구조이니 현재의 모습과 비슷하다. 특이한 것은 풀밭 위에 하얗게 널려 있는 흰색 시트이다. 그 정체는 바로 종이. 세검정 이야기가 끝나면 종이 이야기는 다시 하련다.
이곳 세검정은 경승지이다 보니 많은 이들이 다녀갔다. 당연히 고쳐 짓고 이 지역에 군사 체계를 재정비했으며 연산군의 놀이터 탕춘대를 연융대(鍊戎臺)로 바꾸어 군비를 든든히 한 임금 영조도 다녀갔고, 손자 정조도 다녀갔다. 그때의 이야기가 기록에 전해진다.
정조실록 정조 14년(1790) 9월 기록에는 정조가 이곳에 납신 기록이 보인다.
“임금께서 연융대(鍊戎臺)에 나아가 서총대(瑞蔥臺)의 활쏘기 시험을 보이고, 활쏘기 시험이 끝난 다음 편여(便輿)를 타고 사정(射亭)에 나아가서 시위한 제신과 장신, 군교와 군사, 그리고 승장(僧將)과 승군에게 음식을 내리고 돌아오다가 세검정(洗劍亭)에 이르렀는데, 정자에는 영종(英宗: 영조의 초기 묘호는 영종이었음)의 어제시(御製詩) 현판이 있었다. 임금이 차운하여 칠언 절구를 짓고 여러 신하들에게 화답하여 올릴 것을 명하였다.(幸鍊戎臺, 行瑞葱臺試射. 試射訖, 上仍以便輿, 御射亭, 宣饌于侍衛諸臣、將臣、校卒及僧將、僧軍. 還至洗劒亭, 亭上有英宗御製詩板, 上次韻爲七言絶句, 命諸臣賡進)”
세검정에는 영조가 친히 지은 어제시가 걸려 있었다는 것이다. 정조는 그 시의 운을 받아서(次韻하여) 직접 시를 짓고 신하들에게도 그 운으로 시를 지을 것을 명하였다. 무슨 내용이었을까?
이곳을 찾은 이는 임금뿐 아니라 고산 윤선도, 다산 정약용을 비롯해 많은 문인 소객들이 있었다. 그들은 세검정에 다녀간 글을 남겼다. 그러나 세검정에 기쁨만 있었겠는가? 아픔도 있었다.
정조 11년(1787) 1월 일성록(日省錄) 기록에는 어떤 무인이 여인을 탐하여 간음하려 했는데 말을 안 듣자 끝내 겁탈하려 덤비니 여인이 어찌할 수 없어 세검정 아래 물로 투신하여 자결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일을 임금께 아뢰니 의금부에 하명하여 바로 잡게 한 일도 있었다.(又啓言. 近來貪淫成習. 武弁尤甚. 滿浦僉使 曺命喆. 欲奸前鎭將所眄. 而其女終始守節. 至於不得已之境. 則自投於洗劍亭下之水. 冤哭啾啾. 一鎭騷撓. 不勝其苦. 頭會箕斂. 誦經而辟之. 及其本府之落成. 列鎭俱會. 以此爲問. 則渠亦不敢欺隱. 哀彼守義之女. 抑獨何罪. 而投身水中. 視死如歸耶. 請令道臣. 各別詳覈. 拿致王府. 明正其罪. 從之)

세검정 아래 바위 이름이 ‘차일암’인 이유는?
세검정에서 그 여인이 떨어졌을 아래를 내려다보면 너럭바위가 보인다. 그 바위에는 여러 개의 작은 홈이 보이는데 차일(遮日)을 치기 위해 막대를 고정하던 홈이다. 이 바위 이름이 차일암(遮日岩)인데 무엇 때문에 차일을 쳤을까? 조선 시대에는 임금 곁에 항시 사관(史官)이 있어 임금의 언행을 기록하였다. 이 기록이 사초(史草)인데 임금이 승하하면 이 사초를 모아 정리하고 수정하여 실록(實錄)을 만든다. 실록 편수가 끝나면 그 사초는 불태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먹물을 씻어내어 다시 종이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하게 된다. 기왕이면 종이 공장이 가깝고 좋은 물이 잘 흐르는 곳에서 씻어내면(洗草) 좋지 않겠는가?
그 최적지가 바로 세검정 아래 너럭바위였다. 여기에 차일을 치고 홍제천 물에 씻어내어 원료(펄프)를 회수해 내면 바로 옆 종이 공장으로 보낼 수 있었다.
조선 초에는 나라에서 쓰는 종이의 생산 공장이 전국에 흩어져 있었다. 자연 두께도 다르고 품질도 천차만별이었다. 이에 닥나무 원료가 풍부하고 물 좋은 홍제천 상류 세검정 근처에 종이 공장을 두게 되었다. 태종 때 일인데 조지소(造紙所)라 했다. 일은 역군(役軍)과 죄수와 역승(役僧)에게 시켰다. 세종 때에는 이름을 바꾸어 조지서(造紙署)라 했다. 태종 15년(1415) 7월 기록을 보자.
“조지소(造紙所)를 설치하였다. 호조(戶曹)에서 전날에 의정부에 상납한 각도의 휴지로써 저화지(楮貨紙)를 만들어서 외방에서 종이 만드는 폐단을 줄이도록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置造紙所. 戶曹請以前日議政府上納各道休紙, 造楮貨紙, 以減外方造紙之弊, 從之)”.

종이공장 설치를 3년 전에 논의했는데 드디어 태종 15년에 그 실현을 보게 된 것이다. 그 후 민영화되었는데 한 때 쇠락했던 제지업이 영조가 총융청 등 군사 시설을 옮기면서 다시 활성화되었다.
그 결과 이 동네 이름이 조지서동(造紙署洞)이 되었다. 이 지역 수백 가구가 종이를 만드는 일을 생업으로 할 정도였다. 1941년 세검정이 불탄 것도 곁에 있던 종이 공장 화재로 인한 것이었다. 필자가 어렸을 때도 이 지역에는 장판지 공장이 몇 군데 남아 있었다. 이 지역은 북한산 북악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이용한 제지업과, 광목을 물에 빨아 햇볕에 바래는 포백업, 좋은 물이 필요한 훈조업(燻造業: 메주 만들어 띄우는 일)으로 민초들이 생업을 삼던 곳이었다. 지금은 부촌이 된 평창동, 구기동의 현재와는 거리가 있었다.
씻겨나가는 사초를 본 민초들의 터전
자, 이제 겸재의 부채 그림 세검정을 보면서 어린 시절 능금 가득했던 골짜기를 그려 본다. 이제는 대로변 운치 없는 정자로 남았지만 씻겨나가는 사초를 본 역사의 증인이고, 생업을 위해 치열하게 산 이 골짜기 민초들의 삶을 함께 한 정자였다. 이제 경복궁역에서 출발한 겸재의 그림 속 길 한 꼭지를 여기에서 마무리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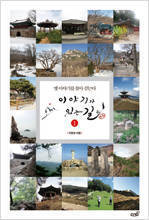
<이야기 길에의 초대>: 2016년 CNB미디어에서 ‘이야기가 있는 길’ 시리즈 제1권(사진)을 펴낸 바 있는 이한성 교수의 이야기길 답사에 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3~4시간 이 교수가 그 동안 연재했던 이야기 길을 함께 걷습니다. 회비는 없으며 걷는 속도는 다소 느리게 진행합니다. 참여하실 분은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사 연락처 010-2730-77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