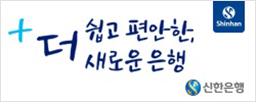“기자분들은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6월 26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 시사저널 건물 앞엔 수 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한편은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한편은 취재를 하기 위해, 그리고 기자회견도 취재도 하지 않는 도보 한 켠에 서서 이를 바라보는 어느 어느 언론사의 기자들. 사회자의 굳은 어조의 말들이 스피커를 통해 인도에 퍼진다. 지나가는 행인, 도로의 차들 외엔 기자들과 기자들만이 존재한다. 기자회견을 하는 기자들도, 취재를 하는 기자들도 표정이 굳어 있다. 여기저기에 아는 기자들끼리 가볍게 목례만 할 뿐이다. 맨 가장자리에 선 한 젊은 여기자가 입술을 굳게 문다. 하지만 이미 눈은 충혈 되어 있다. 입술을 악다무는 것으론 제어가 되지 않는다. 눈을 크게 뜨고 하늘을 올려 본다. 섭씨 30도에 달하는 화창한 날씨지만 마르는 속도보단 고이는 속도가 더 빠르다. 이내 고개는 떨궈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른다. 기자회견이 계속된다. 앰프에선 떨리는 목소리로 회견문이 낭독된다. 여기저기 카메라의 셔터음이 터지는 소리가 들리고 자동차의 소음이 들리지만 기자회견장엔 정적이 흐른다.

시사저널 기자들이 독자들에게 드리는 글이 낭독될 순서. 내정된 낭독자가 눈물 때문에 도저히 읽을 수가 없자 사회자는 편집국 7년차인 막내 기자에게 낭독을 떠민다. 하지만 편집국 막내도 낭독할 수 없었다. 기자회견 내내 하늘만을 쳐다보던 그는 마이크를 넘겨받자 북받쳐오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결국 세 번째 낭독자에게로 넘어갔다. 전 편집장은 덤덤하게 편지글을 읽어 내려갔다. 서러움과 함께 분노가 묻어난다. 언론사가 어려워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도 취재와 보도는 계속됐다. 그만큼 그들은 사명감이 있었다. 하지만 몰랐다. 그렇게 지켜 온 언론사를, 삼성 관련 보도 하나 때문에 전 기자들이 회사 밖으로 밀려나고, 급기야는 그들의 삶 자체인 <시사저널>을 사라지게 할 줄은 정말 몰랐다. 마지막 지자회견장에서 깃대를 쥔 기자의 손엔 여전히 펜과 기자수첩이 함께 쥐어져 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은 자신들의 땀내가 배어있는 5층 편집국을 찾았다. 문은 잠겨 있고 복도엔 ‘시사저널 편집국’이라는 간판이 탁자 위에 놓여 있다. 기자들은 하나 둘 편집국 현판에 국화를 헌화하며 <시사저널>에 작별을 고했다. 먼저 헌화한 편집장, 이제 시사저널의 마지막 편집장이 되어버린 편집장은 좁은 복도 끝의 화장실에서 맑기만 한 하늘을 바라본다. 시커먼 어둠만이 잠겨 있는 편집국 안에 남았고, 작별을 고하는 복도엔 기자들의 뜨거운 숨결이 남았다. 작별을 고하고 나니 속이 후련해진 모양이다. 이제 눈물을 보이는 기자들은 없다.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기자들이 건물 앞에 섰다. 안 내려오는 식구들이 있다. 사진부장은 사진 찍자며 동료에게 전화를 건다. 마지막으로 내려온 기자의 손엔 ‘시사저널 편집국’이란 현판이 들려 있었다. -글 / 유성호 기자 -사진 / 박득진 객원기자










 제24호
제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