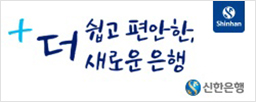글·이수인 (작가·시낭송가) <유년의 기억>이란 주제로 격주연재 수필을 담는 이수인 시인은 서울예대에서 극작을 전공하고, MBC·KBS 드라마 과정을 수료하였다. <시문학>을 통해 등단한 뒤, CBS TV에서 시낭송을 진행했다. 저서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등이 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죽기 전에 용서를 빌겠노라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임종 순간까지 끝내 오지 않으셨다. 할아버지는 혼수상태에서도 잠깐 정신이 들면 아버지에게 “네 에미를 죽기 전에 꼭 봐야 하니, 어서 데려 오라”며 눈에 빛을 내셨다. 겁에 질린 나는 마루로 나가 동동거리며 엄마를 기다렸고, 할아버지의 가래 끓는 소리와 헐떡이는 숨소리가 마루까지 들렸다. 그때 삐꺽 철 대문이 열리고, 작은집에 할머니를 모시러 갔던 엄마가 실망스런 표정에다 추위에 파래진 얼굴로 허겁지겁 마당으로 들어섰다. “아버님 눈감으시기 전엔 안 오신대요. 상 치른 뒤에 오시겄다는디. 참, 대단헌 양반여요.” 엄마의 인기척에 급하게 방에서 뛰어나온 아버지에게 엄마가 작은 소리로 하는 말을 엿듣고, 나는 어린 마음에도 무척 실망이 되어 처마 끝에 달린 커다란 고드름만 툭툭 분지르고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가 떠나시던 그해 여름이 떠올랐다. 옷 보따리 몇 개를 둘둘 말아놓고, 할아버지와 그 쪽머리 여인이 일어나기 전에 새벽같이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채를 한걸음에 내달아 몇 마디 악쓰듯 퍼붓고는 철 대문을 부수듯 닫고 가시던 할머니를…. 그것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승에서 나눈 마지막 인사였던 것이다. 할아버지는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작은아버지와 아버지가 안방으로 모셔오는데, 나는 무서움에 오줌을 지리고 말았다. 태어나 처음으로 죽은 사람을 보았다. 게다가, 평소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 가운데 유달리 나를 예뻐하셔서 오빠가 불만이 있었는데, 벌써부터 내게 눈짓으로 이제 할아버지 안 계시니 두고 보자는 태도를 보여 나는 한꺼번에 많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무엇보다 다시는 할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슬픔이 가장 컸으나, 한편으로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시신이 무섭고 싫으니 그 역시 큰 두려움이었다. 하얀 홑이불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둔 할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무서워 나는 안방 근처에는 얼씬도 못 하고 징징거리고 다니다가 작은할머니에게 혼났다. “지지배 같으니라구~. 살아서는 할애비가 오직 지만 이뻐서 용돈 줘, 사탕 사줘, 뻔질나게 업어주고, 오직 수인이 수인이 허더만, 의적머리 없는 가시나가 지 할배 생이도 안 나갔는디 무섭다고 딱 돌아서네. 아따, 누구(내 생각엔 할머니를 지칭하신 듯) 손녀 아니랄까봐, 지지배가 차기는…. 츳츳,(나를 한번 더 보시더니) 죽으먼 나무토막이나 똑같은 게 사람여 지지배야. 무섭긴 산 사람이 더 무선거여~.” 나는 눈물을 멈추고 못마땅하여 작은할머니를 쏘아보았다. “오메! 이 쪼깐은 지지바가 큰 어른을 옴팡지게 쏘아보네. 아고, 야가 크먼 뭐가 될낀가? ” 그때 엄마가 너무 심하다 싶었는지 한마디 거들었다. “작은어머이는…, 아직 어린것이 모 안다고 그러세요? 쟈가 무섭다는 것은 아버이하고 정 띨라고 그러는가 싶고만요. 아무리 쪼깐혀도 속은 옹골차고 따신 아여요.” 정 떼려고? 정말 그랬을까? 나는 할아버지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두려움에 앞서, 할아버지가 안방 윗목에 하얀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누운 현실이 끔찍하게 싫고 무서웠다. 그날 밤, 집이 무서워 잠들지 못한 나는 결국 작은집 할머니 곁에 데려다 달라고 떼를 쓰고 울어서, 한밤중에 큰오빠가 무릎까지 푹 빠지는 눈 속에 나를 업고 30분 이상을 걸어야 하는 읍내 작은집으로 향했다. 내 한쪽 손에는 부채표 까스활명수 한 병이 꼭 쥐어져 있었다. 감기 때문인지 열이 있다며 엄마가 그 사이에 챙겨주신 것이다. 대학생인 큰오빠는 나보다 열다섯 살이나 위여서 키나 육중한 몸이 이미 어른다워, 오빠의 등판은 흡사 할아버지에게 업혀 있을 때처럼 포근하고 따뜻했다. 잠시 오빠의 포근한 등에서 고개를 내밀고 하늘을 보니, 크고 작은 별들이 총총하게 박혀 있는 멀고 먼 하늘나라가 곧 할아버지께서 가실 곳 같았다. 나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할아버지도 저렇게 별이 되실랑가? ” 그 넓은 들판은 천지가 눈으로 덮여 밤길인데도 앞이 환해 마치 동이 터서 날이 밝아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마 그날 밤처럼 쓸쓸하고 아름다운 호남평야의 백야는 자라면서 몇 번 다시 보지 못하였으리라. 우리가 작은집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그때까지 주무시지 않고 계셨다. 추운데 이 시간에 어쩐 일이냐면서 이부자리 속으로 나를 포옥 밀어 넣고, 오빠에게 이것저것을 물어보셨다. 오빠는 장손이기 때문에 곧장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할머니는 문밖에까지 따라 나서며 오빠에게 중요한 뭔가를 당부하시는 것 같았다. 밤에 자다가 나는 몇 번이나 놀라 깨어났다. 할머니는 연신 내 이마를 짚어보며 근심어린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할아버지에 대해 한마디 물으셨다. “수인아, 할배 죽으니 섭섭햐?” “응.” 나는 할머니의 눈치를 살피면서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할머니는 이내 한숨을 푹 쉬고 고개를 돌리더니, “못된 놈의 영감!" 하고 일어나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가셨다. 잠시 후 할머니는 아무 일 없는 듯 다시 들어오셨지만, 나는 잠들지 못하고 그날 밤 할머니의 애끓는 통곡 소리를 듣고 말았다. 할머니의 울음은 마치 시조와 같이 구슬프고 운율을 타서 나는 할머니가 우는지 시조를 읊는지, 더러 애끓는 울음소리가 중간에 섞이지 않았으면 몰랐을 것이다. “가거라 가거라, 이 몹쓸 영감아!” “너 없어도 잘 산다, 금수 같은 인간아!” “이렇게 갈려면서 내 가슴에 대못은 왜 치고 가느냐!” “어흐흑~아이고 ~아이고~.” 밤을 하얗게 새운 할머니는 배고픈 참새들이 짹짹거리자 그제서야 일어나 방문을 열고 정지로 나가 군불을 때셨다. 나는 노곤함 속에 잠시 잠이 들었는데,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았다. <다음에 계속>










 제96호
제9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