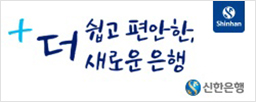골프에서 스윙은 골프 볼을 정확하고 멀리 보내기 위한 일련의 동작으로서, 사람마다 각양각색의 스윙 폼을 가지고 있다. 골프가 태생해서 지금까지 골퍼라면 누구나 멋있고 아름다운 폼으로 공을 멀리 치고 싶은 욕망, 즉 “Far and Sure”(멀리 똑바로)의 큰 명제는 계속되고 있다. 많은 골프 전문가들과 생체체육 전공자들이 100여 년 가까이 연구를 계속해 와 이론은 정립되어 있으나, 일반 골퍼들에게는 잘 부합이 되지를 않아서, 아직도 장타는 골퍼들에게 제일 큰 욕망이자 숙제이다. 현대 골프 스윙 이론을 완성시킨 미국의 벤 호건이나 바돈 그립의 창시자 영국의 해리 바돈은 골프 스윙 때 동작을 컴팩트하게하고 팔을 항상 백 스윙 동작에서 옆구리에 붙이도록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오소독스한 이론도 개인의 스윙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뚱뚱한 사람, 키가 큰 사람, 아주 작은 사람, 배가 나온 사람, 나이가 먹은 노인, 연약한 여인 등등 체형이 다양하여 각자 독특한 폼으로 스윙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11일 미국의 존 댈리 프로가 이탈리아 토리노 로열 골프장에서 열린 유러피언 BMW 투어에서 1m80cm에 127kg의 육중한 몸매로 평균 드라이브 거리 309야드를 날려 합계 11언더파를 쳐 공동 2위를 기록, 아직도 그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그만의 특유한 파워풀한 스윙 동작으로 공을 때리는 것을 보면 모두 다 입이 딱 벌어진다. 필자의 30여 년 골프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 아름다운 멋진 폼에서 좋은 스윙이 나오고 그 결과 공은 멀리 똑바로 나간다는 것을 터득하였다. 몸에 무리하게, 스윙 폼을 생각하지 않고 장타만을 고집하려고 스윙을 크게 하면 오히려 골프가 망가져 공의 방향이 흐트러지고 거리가 반대로 줄어든다. 좋은 스윙이란 자연스런 자세에 물 흐르듯 리듬이 있는 유연한 동작이다. 이런 스윙을 함으로써 골프 스코어가 변함이 없고 멋있는 폼으로 여러 골퍼들을 즐겁게 해준다. 그러나 골퍼의 욕망은 변함이 없어 조금이라도 골프 드라이브의 거리를 늘리려고 무한히 애를 쓰고 있다. 골프 연습장에 가보면, 10명 중 7명은 드라이버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골프가 어려운 이유는 지금보다 좀 더 거리를 늘리려고 무리한 동작을 하면 스윙이 망가져버려 다시 100 가까운 스코어를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마리의 토끼를 쫓으면서 거리도 내고 스코어도 좋아지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보다 스윙의 아크를 크게 하는 일이다. 특히 톱 스윙 때 드라이버 헤드를 좀 더 하늘 쪽으로 향해 팔을 뻗으면 자동적으로 스윙 아크가 커지게 된다. 필자는 나이가 60대 중반이나, 지금도 드라이버의 거리는 젊은 장타자들 못지 않게 나가서 같은 나이 또래의 친구들과는 무려 50야드의 거리 차이가 나 그 장타 비법을 여러 사람이 물어 온다. 그 이유는 스윙 아크를 크게 하기 위해 매일 연습용 봉으로 스윙을 반복하여 100회씩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골프에서 장타를 친다고 해서 스코어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나, 역시 골프의 참맛은 드라이버로 친 공이 하늘을 가르며 빨랫줄처럼 쭉 뻗어 나가는 그러한 통쾌함일 것이다. 아무리 신무기 드라이버가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기본인 스윙의 개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골프에서 장타는 끊임없는 스윙에 대한 메커니줌을 연구하고 실천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중하위 핸디캡 골퍼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제119호
제1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