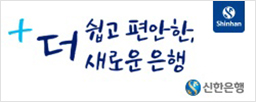골프에서는 강약의 리듬 조절을 잘하고 광적인 집중력에 멘탈이 강한 자가 승자가 되는 법이다. 골프에서 장타를 치는 자가 항상 우승한다면, 체력이 강한 거구의 장사가 골프 선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골프는 드라이브의 길이가 짧은 선수도 우승할 수 있다는 사실을 키가 작은 김미현 선수와 180cm가 되는 미셸 위를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미셸 위는 드라이버를 평균 280야드 날리는 장타자여서, 남자 PGA 대회에 초청을 받아 가도 레귤레이션 온에 지장이 없다. 이런 장타를 치는 미셸 위는 아직도 LPGA에서 우승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러나 김미현 선수는 드라이버가 평균 240야드 정도이지만 페어웨이우드를 잘 치는 장점과 숏 게임으로 LPGA에서 여러 번 우승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골프라는 운동은 참으로 이상한 운동이어서, 장타자는 그린을 공략할 때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수없는 필드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드라이버 샷이 길면 장점도 있지만, OB라는 복병이 항상 숨어 있다. 반면, 드라이버 샷이 짧은 단타자는 14개의 클럽을 최대한 이용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스코어 메이킹을 하려고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궁리를 한다. 이것이 골프의 실력을 증진시키는 가장 좋은 첩경임은 물론, 우승을 향한 지름길이다. “골프에서 드라이버 샷은 쇼이고 퍼팅은 현금이다(Driver is show putt for dough)”라는 명언을 우리는 자주 접한다.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연필 길다고 공부 잘하나”가 여기에 해당되는 용어일 것이다. 그런데도 골퍼들은 단지 쇼에 해당되는 드라이버 연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핸디캡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연습하는 방법이 퍼트, 어프로치, 칩 샷, 벙커 샷 등과 같은 숏 게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오지영 선수는 샌드웨지를 하도 많이 연습하여 두 달 만에 교체를 할 정도였다고 한다. 우리나라 여자 골퍼들이 미국 LPGA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비결은 많은 시간을 쏟아 숏 게임에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퍼트를 3시간 이상 매일 연습하는 집중력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5월 18일 뉴저지에서 개최된 미 LPGA 사이베이스 클래식에서 우승한 오지영 선수는 한마디로 “나의 숏 게임 능력이 장타자를 압도하였다”고 우승 인터뷰에서 토로하였다. 페데르 센(노르웨이)과 브리태니 런시컵은 300야드를 날리는 장타자여서, 항상 공이 40야드는 앞에 나가 처음에는 주눅이 들었지만, 집중력으로 플레이를 함으로써 2등인 페데르센과의 차이를 4타차나 벌리고 우승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일반 아마추어들과 골프 라운드를 나가 그의 핸디캡이 얼마나 되는가는 3홀만 돌아보면 금방 실력을 간파할 수 있다. 특히 어프로치가 부드럽고 퍼트를 유연하게 하는 솜씨를 보면 금방 로우 핸디캐퍼 실력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우리 아마추어 골퍼들은 이번 오지영 선수의 우승을 통해 숏 게임의 중요성을 다시 인지하였는 바, 오늘부터 당장 많은 숏 게임에 시간을 할애하여 연습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제120호
제1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