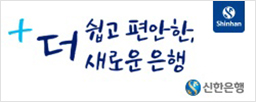▲러시아 혁명의 진원지인 궁전광장 전경. 영화 ‘닥터 지바고’에도 등장한다. 사진 = 김현주 ▲100개가 넘는 섬과 365개 다리가 연결돼 ‘북방의 베니스’라 불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구 500만 명으로 러시아 제2의 도시다. 사진 = 김현주 ▲이삭 성당은 1818년부터 40년에 걸쳐 건축됐다. 101m의 높이를 자랑하는 제정 러시아 시대 최대의 건축물로, 황금 돔이 눈길을 끈다. 사진 = 김현주 ▲네바강변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해바라기족. 북극 해바라기족들의 여름 해 사랑이 느껴진다. 사진 = 김현주 ▲네바강 유람선을 타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이곳저곳을 순회하다 발견한 그리스도 부활교회(피의 사원). 사진 = 김현주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3일차 (상트페테르부르크)
북방의 베니스
여기는 북위 60도, 내가 평생 가본 곳 중 위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여름 햇살은 따갑다. 1712년 모스크바에서 천도해 1917년 볼셰비키 혁명까지 205년 동안 러시아의 수도였다. 인구 500만 명, 러시아 제2의 도시다. 100개가 넘는 섬과 365개의 다리로 연결돼 있어 ‘북방의 베니스’라고 불린다. 발틱해에서 내륙으로 30km 들어온 지점에 있어 수운(해운)을 통해 핀란드 헬싱키, 스웨덴 스톡홀름, 에스토니아 탈린 등과 연결되고 러시아 국내 및 유럽 각 지역과 항공기가 빈번히 다닌다.
유럽을 향한 창
표트르 대제가 1703년 네바강(핀란드어로 ‘늪’이라는 뜻) 하구에 러시아의 서유럽화를 위한 전진 기지 역할을 하겠다는 야망으로 건설을 시작해 9년간 대역사 끝에 1712년 완공한 도시다. 푸시킨이 이곳을 ‘유럽을 향한 창’이라고 불렀던 만큼 서유럽 건축 양식뿐 아니라 자유주의 사상을 일찍 받아들인 곳이다. 결국 인류 최초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진원지가 됐다.
또 다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이곳은 모스크바와는 무척 다른 분위기를 풍긴다. 모스크바가 사회주의 냄새를 풍긴다면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제정 러시아 냄새를 풍긴다. 모스크바가 서민적 국제도시라면 여기는 귀족적 유럽도시다. 인종도 좀 다르다. 여기는 완전히 백인 지역이다. 북구 스칸디나비아에 가까운 이곳에는 금발에 푸른 눈을 가진 사람들이 유독 많다.
호텔은 네프스키 거리 중심가 편리한 위치에 있다. 호텔에서 나와 네프스키 대로를 따라 서쪽으로 걸으니 곧 궁전광장이 나온다. 영화 ‘닥터 지바고’에서 1905년 ‘피의 일요일’을 묘사했던 장면에 등장하는 바로 그곳이다.
시위하는 군중들의 함성과 무차별 발포와 말발굽으로 시위 군중을 짓밟는 차르 친위기병대의 모습이 생생히 눈앞에 그려진다. 그 역사의 현장에 서니 감개무량하다. 어찌 보면 차르보다 더한 억압과 권위의 상징이었을 공산당 정권의 등장으로 퇴색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피의 대가로 얻은 자유와 진보가 느껴지는 땅이다.
광장 동쪽으로는 반원형 개선 아치를 갖춘 구 참모본부, 그리고 광장 중앙에는 1834년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을 기념해 세운 높이 47.5m의 알렉산더 원주가 있다. 광장 북쪽에는 러시아 바로크 예술의 걸작인 겨울 궁전이 네바강을 끼고 230m나 뻗어 있다.
제정 러시아 황제들의 거처였던 겨울 궁전은 녹색 외관과 흰 기둥이 어울리는 로코코 양식의 거대 궁전으로 1056개의 방과 2000개가 넘는 창문으로 이뤄졌다. 무엇보다 건물 지붕 위에 빼곡히 장식된 170개가 넘는 조각상이 대국의 스케일을 보여준다.
세
겨울 궁전과 부속 건물을 포함해 6개의 건물로 연결돼 있는 에르미타주 국립박물관은 대영박물관, 루브르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미술관)이다. 250만 점 작품을 모두 감상하려면 1점당 1분씩 계산해도 5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원시 문화와 러시아 문화, 근대 유럽문화 순으로 분류된 전시물들은 건립 당시 유럽 최고 수준의 미술품들을 구입해 놓았다. 다빈치, 라파엘, 미켈란젤로, 루벤스, 렘브란트 등 낯익은 작가들의 작품이 눈에 들어온다. 국토와 인구에서는 대국이지만 유럽 북동쪽 변방에 자리 잡은 불리함을 딛고 유럽의 중심으로 대접받고자 몸부림쳤던 표트르 대제의 심정을 읽고도 남는다.
북국의 해바라기족
에르미타주에서 다리를 건너 작은 섬에 있는 페트로파블로프스키 요새로 향한다. 북위 60도의 태양이 생각보다 강렬하다. 표트르 대제가 스웨덴 군의 침략을 막기 위해 네바강 하구 델타 지역에 1703년 건설한 요새를 둘러싼 두꺼운 성벽과 성채가 아직도 건재하다.
요새 안에는 피터폴 대성당이 있어서 ‘피터폴 요새’라고도 불린다. 피터 성당의 121.8m 첨탑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어디에서도 보일 정도로 두드러지게 높다. 성채 주변 작은 백사장에는 일광욕을 즐기는 시민들이 많다. 백인들의 암 사망률 1위는 피부암이라지만 북국 해바라기족들의 여름 해 사랑을 말릴 수 없다.
요새를 나와 강변을 한참 더 걸으니 순양함 오로라호가 영구 정박, 전시돼 있다. 1900년 진수해 1904~1905 러일전쟁에도 참가한 7000톤 급 순양함이다. 1917년 10월 1일 여기서 쏘아올린 함포 한 방이 러시아의 역사를(인류 역사까지도) 바꾼 혁명의 시작이었다고 한다. 선박 내부 전시물 중에는 2001년 한국 방문 기념패도 있다.
금발 미녀의 도시
다시 넵스키 중심가로 나온다. 메트로 노선이 제한되고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시스템이 불편한 이 도시에서 오늘처럼 태양이 뜨거운 날, 이곳저곳을 이동하는 것은 보통 고역이 아니다. 발품을 팔아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솔로 배낭 여행자에게 가장 괴로운 방문지가 여기가 아닐까 싶다.
그나마 상트페테르부르크가 풍기는 우아한 멋이 피로를 많이 덜어 준다. 높지 않은, 그러나 화려한 19세기 건축물들은 여기가 러시아 문화 예술의 중심임을 말해 준다. 게다가 용모와 체격이 빼어난 슬라브 금발 미녀들이 활보하는 거리에 섞여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은 즐겁게 지나간다. 또한 이 도시는 현대 러시아 지도자들을 여럿 배출했다. 푸틴과 메드베데프가 이곳 출신인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교회, 성당과 함께 박물관이 많다. 에르미타주 미술관을 비롯해 대포 박물관, 해군 박물관, 프로이트 꿈 박물관, 인류학 박물관, 종교역사 박물관, 러시아 정치경찰역사 박물관, 러시아 정치사 박물관, 통신 박물관, 남극북극 박물관, 쇄빙선 박물관, 파블로프의 개 박제로 유명한 위생박물관, 철도박물관, 그리고 심지어는 제정 러시아 말기 괴승 라스푸틴의 성기가 보관돼 있다는 에로틱 박물관까지 구미가 당기는 박물관이 한두 곳이 아니다.
그러나 짧은 여정, 그리고 주요 박물관이 휴관하는 화요일에 이 도시를 방문한 공교로움이 겹쳐 다음 기회에 좀 더 여유로운 일정으로 이 도시를 다시 찾기로 할 수밖에 없음이 매우 아쉽다.
네바강 유람선에서 즐긴 여름 저녁
아직 밝지만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니 해가 기울어 금세 시원해진다. 저녁 7시 30분 네프스키 메트로역 부근 운하에서 출발하는 유람선에 승선한다(500루블). 유람선은 도시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운하를 이 골목 저 골목 누비며 순회를 시작한다. 운하 위 보행교에 머리가 닿을 듯 지나가는 사이, 간혹 요란한 엔진소리와 함께 물을 뿌리며 지나가는 짓궂은 제트스키어들을 차라리 즐겁게 겪으며 ‘북방 베니스’의 고즈넉한 여름 저녁을 즐긴다.
크고 작은 다리마다 난간 모양과 장식이 제각각 다르다. 어떡하면 서로 다르게 할까를 일부러 연구했더라도 이것보다 더 다를 수는 없었을 것 같다. 1시간 15분 운행하는 동안 육상 대중교통 수단이나 도보로는 닿기 어려운 그리스도 부활교회(피의 사원) 같은 곳을 옆으로 혹은 가까이 지나가며 카메라에 담을 기회를 준다. 
유람선에서 내리니 저녁 8시 45분이지만 사방이 아직 훤하다. 구름 드리워진 북구의 백야는 상쾌하기 이를 데 없다. 호텔에 그냥 돌아가기에는 아쉬워 유람선이 지나올 때 가장 멋진 풍경을 선사한 이삭성당까지 걸어서 간다.
곳곳에 공연장과 동상, 분수, 정원이 늘어서 있는 네프스키 대로를 걷는 맛이 일품이다. 알렉산더 극장은 멋지다. 모스크바에서 봤던 볼쇼이 극장 복사판 같다. 그리스식 원주와 지붕 위 말 네 마리 장식이 똑 같다.
황금 돔을 얹은 이삭 성당
운하를 따라 걷다보니 이삭 성당의 장엄한 돔이 눈에 들어온다. 1818년부터 40년 걸려 건축한 높이 101m짜리 제정 러시아 시대 최고, 최대의 건축물이다. 내부 공개 시간이 지나서 성당 내 성화와 모자이크 관람, 그리고 코폴라 구경은 못했지만 100kg의 금이 사용된 성당 지붕 원형 돔을 가까이서 보니 황홀하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당을 세계 10대 기적의 하나라고 부르기도 한다. 성당 남쪽 광장 건너 기마상을 돌아 호텔로 돌아오니 밤 11시가 다 됐지만 아직 주변이 훤하다.
(정리 = 김금영 기자)
- 관련태그
-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제434호
제43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