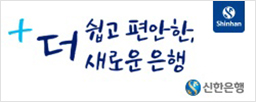(CNB저널 = 김영두 한국골프칼럼니스트협회 부이사장) 노트북이며 커피가 든 보온병이며 간식거리가 든 배낭을 메고 운동화를 신고 터덜터덜 버스정류장을 향해 걷는데 빈 택시가 선다.
(CNB저널 = 김영두 한국골프칼럼니스트협회 부이사장) 노트북이며 커피가 든 보온병이며 간식거리가 든 배낭을 메고 운동화를 신고 터덜터덜 버스정류장을 향해 걷는데 빈 택시가 선다. “국회 정문으로 들어가서 도서관 앞에 세워주세요.”
국회도서관이든 남산도서관이든, 도서관으로 가는 택시를 탈 때면 꼭 뒤통수가 깔끔한 젊은 남자 기사가 낚인다.
일 년 전쯤, 세찬 비가 하늘에 굵은 획을 그으며 내리던 날, 남산도서관에 가려고 택시를 탔을 때도 그랬다. 뒷자리에 노트북 가방과 엉덩이를 들이밀며 행선지를 대자, 운전기사가 실내경을 급히 요리조리 조정한다.
얼핏 거울에서 되반사한 탐색의 시선이 쪼듯이 날아온다. 택시 운전기사란 행선지를 대는 목소리만으로 승객의 나이나 직업 등을 다 파악한다. 적어도 큼지막한 책가방을 들고 근시 안경을 쓴 여인네가 도서관을 행선지로 댄다면 그는 당연히 책, 공부, 연구, 자료조사 등 학구적이나 문화적 용무를 상상할 것이다.
“남산에 있는 도서관 말씀이죠?”
운전기사는 내가 말한 행선지를 복창하더니, “옛날에 남산도서관에서 빵 사준 누나 같아서요”라고 나에게 작업성 발언을 했다. 와이퍼는 차창에 쏟아지는 빗물을 다 씻어내기가 힘에 겨운 듯이 고통스런 날갯짓을 하며 시야를 가렸고, 차안에는 흘러간 팝송이 귀에 가득 고이면서 청각을 마비시켜 그의 말을 잘못 들었지 싶었다.
“공부하러 도서관 가세요?”
뒤통수가 깔끔한 남자의 관심이 건너왔다. 아마 나의 행선지가 그냥 국회나 구청이었다면 탐색하는 어조로 되묻지 않았을 것이다.
“늘 가지요. 젊은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자리를 잠시 비웠다가 돌아와 보면 책상위에 딱지처럼 접은 편지랑 셀로판지에 쌓인 사탕이 놓여있고는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눙치는 솜씨를 부려본다.
“옛날에는 젊은 선남선녀의 만남이 쉽지 않아서, 도서관은 연애걸기에 맞춤한 장소였죠. 도서관 간다면 밤외출도 허락해주셨고요.”
그랬던가, 돌아보니 나는 내가 다니던 여자대학의 도서관보다 옆 대학의 도서관을 더 자주 기웃거렸는데, 살풋 연애의 기회를 포착하려는 뜻도 있었지 싶다.
골프 코스가 골프만 하는 곳이더냐
얼마 전 일이다. 한국의 4월과 5월에 골퍼가 골프 라운드를 안하는 것은 골프를 모독하는 행위라며, 후배들이 나를 초대했다. 물론 땜빵 한 자리 채워달라는 의도인 줄은 다 알지만, 불러주는 것만도 황공감사해서 간식거리도 싸들고 뛰어갔다.
만물이 소생하고 대지가 생명의 기운을 품은 신록의 5월, 폐부로 스며드는 공기는 청량하게 말랑말랑했다. 라운드를 시작하면서부터 남성 4명으로 이루어진 앞 조가 여성 4명으로 이루어진 우리를 흘끔거리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은 연애소설을 주로 쓰는 작가의 직업적 예민함 때문이었을까. 잠시 쉬고 나온 그늘집 다음의 파3홀 팅그라운드에서 우리는 날개를 접고 쉬고 있는 종이비행기 한 대를 발견했다.
가까이 가보니 안타깝게도 종이비행기는 길고 튼튼한 티에 의해 날개가 묶여있었다. 향기로운 산들바람이 불어주는 풀밭에서 찢긴 날개를 펄럭거리고 있었다. 티를 뽑아내자 비행기는 비상의 나래를 폈다. 그러자 접힌 날개에 갇혀있던 글자들이 초록의 여린 풀 위로 쏟아져 내렸다. 라운드를 끝내고 우리들을 저녁식사에 초대한다는 앞 조의 전언이었다.
나중에야 당사자도 모르게 이루어진 우연을 가장한 ‘맞선보기’ 작전인 줄 알게 되었다. 우리 일행 중 하나가 잘난 체만 너무 하다가 나이만 쌓은 전문직 노처녀였고, 앞 조에 그녀와 짝 지어도 좋을만한 남성이 있었던 모양으로, 주위의 친구들이 골프 라운드를 핑계 삼아 맞선자리로 이끌어낸 것이었다.
도서관이 공부만 하는 곳이더냐, 골프 코스가 골프만 하는 곳이더냐.
(정리 = 공미나 기자)
- 관련태그
-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제538호
제53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