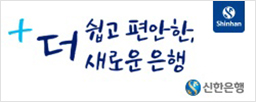(CNB저널 = 김덕상 한국골프칼럼니스트협회 명예이사장) 30년 전에 대우그룹이 해외의 정유 공장을 인수했다. 당시 리비아 건설 공사를 많이 했던 대우가 공사 대금을 현금으로 받지 못하고 원유로 받았다. 원유를 정제해야 상품으로 판매가 가능한데, 국내 기존 정유 업계의 반발로 원유를 국내로 반입할 수 없어서 부득이 해외의 정유 공장을 인수했다. 마침 그곳이 벨기에 안트워프 항구라서 한국 비즈니스 총괄 책임자였던 내가 벨기에로 날아가 안트워프 법인의 임직원들과 협력해 그 정유 공장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CNB저널 = 김덕상 한국골프칼럼니스트협회 명예이사장) 30년 전에 대우그룹이 해외의 정유 공장을 인수했다. 당시 리비아 건설 공사를 많이 했던 대우가 공사 대금을 현금으로 받지 못하고 원유로 받았다. 원유를 정제해야 상품으로 판매가 가능한데, 국내 기존 정유 업계의 반발로 원유를 국내로 반입할 수 없어서 부득이 해외의 정유 공장을 인수했다. 마침 그곳이 벨기에 안트워프 항구라서 한국 비즈니스 총괄 책임자였던 내가 벨기에로 날아가 안트워프 법인의 임직원들과 협력해 그 정유 공장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김우중 회장의 자서전 첫머리에 등장하는 바로 그 정유 공장이었다. 그 후 안트워프 임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계약 갱신 차 매년 6월 하순에는 벨기에를 방문했다. 그게 나의 글로벌 골프 마케팅의 시작이었고, 그 이후 나는 20여 개국 50여 개 도시의 200개 해외 골프장에서 다양한 고객들과 약 300라운드를 기록했다.
안트워프의 영업본부장 존은 골프광이었다. 허리가 불편해 잘 구부리지는 못했지만 골프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였다. 그가 회원이던 링크벤(Rinkven) 골프장은 안트워프 시내에서 가까워서 점심이나 저녁을 호텔이나 시내 식당에서 하기보다는 클럽하우스로 가서 편한 분위기의 식사를 즐겼다.
1995년 6월 21일 해가 가장 긴 하지였다. 둘이서 클럽하우스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존이 “해도 긴데 골프 한 번 할까?” 하며 내게 물었다. 이게 웬 떡이냐 하며 골프광인 내가 덥석 오케이했다.
조명 없이 자연광으로 골프 치던 그 시절
그때 시간이 오후 8시 15분쯤이었는데, 골프장엔 아무도 없고 우리 둘뿐이니 빨리 치면 어두워지기 전에 라운드를 마칠 수 있겠다는 그의 말에 허겁지겁 옷 갈아입고 1번 홀로 달려갔다. 마침 1번 홀은 스폰서가 우리 회사의 벨기에 법인이어서 아주 맘 편히 신선놀음 같은 골프를 시작했다.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허겁지겁 치다보니 그다지 좋은 스코어는 낼 수 없었지만, 2시간 남짓한 시간에 걸어서 마친 라운드로는 꽤 빠른 진행이었다. 그 후에 나는 국내에서도 가끔 친구와 골프장의 첫 번째 팀으로 나가서 두 시간 반에 라운드를 마치고, 회사 출근 시간 전에 사무실에 도착했던 적이 많았다. 아마도 이때부터 연습 스윙 없이 바로 샷을 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습관이 몸에 밴 것 같다.
아들이 골프 유학했던 호주의 힐스(Hills) 학교를 방학 때 방문하면 학교 전용 코스에서 교장 선생님이 제공한 버기를 타고 아들과 둘이 하루 64홀씩 라운드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전에 각 18홀씩 돌고, 저녁 식사 후에 9홀을 친 후, 1번 홀 그린 뒤편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면서 파5홀인 1번 홀을 플레이했기 때문에, 9홀씩 7라운드에 1홀을 추가한 64홀을 쳤던 것이다. 둘이서 라운드하던 중 아들이 홀인원을 본 축복도 빠른 라운드 속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실현하기 어려운 꿈같은 이야기지만, 나의 빠른 골프 라운드는 해가 가장 길었던 하지에 벨기에 안트워프 링크벤 코스에서 그 역사가 시작됐다.
(정리 = 김금영 기자)
- 관련태그
-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제543호
제54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