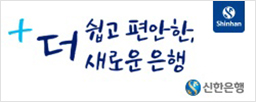(CNB저널 = 이한성 옛길 답사가) 겸재 그림 안현석봉(鞍峴夕峰)처럼 안현(안산)에 언제나 평안의 횃불 하나 피어 오르면 좋으련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다. 전호(前號)에 소개했듯이 청장관 이덕무의 글처럼 안현에서는 치열한 전투도 있었다. 인조 2년(1624년) 일어난 이괄의 난 때 이곳 안현에서 건곤일척(乾坤一擲) 명운을 건 전투가 벌어졌던 것이다. 장만(張晩)이 이끄는 관군과 이괄이 이끄는 반군이 이곳에서 맞붙었다. 그날의 일을 인조실록을 통해 보자. 인조 2년(1624) 2월 11일 기록이다.
관군이 적과 안현(鞍峴)에서 크게 싸웠는데, 적병이 크게 패하여 도망쳤다. 애당초 이괄이 정사(靖社: 사직을 안정되게 한다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인조반정을 말함)하던 때에 큰 공을 세웠으나 조정의 대우가 그의 뜻에 차지 못하였다. 이괄이 자기의 재능을 믿고 국가를 경시하여 불궤(不軌)를 음모하였는데, 그의 아들이 잡히게 되자 자기 휘하를 협박하고 한명련(韓明璉)과 연합 모의하여 군사를 일으켜 반역하였다. 두 역적은 모두 용병(用兵)을 잘하여 허술한 틈을 타서 곧바로 치려는 생각을 가졌는데, 원수(元帥) 이하가 겁내어 지체하면서 감히 교전하지 못하였다. 마탄(馬灘: 평양 동쪽 대동강)에서 패하게 되어서는 병세가 더욱 꺾여 적이 마치 무인지경을 밟아 오듯 하여 드디어 경성에 들어왔다.
제장이 뒤따라 이르렀다. 원수 장만(張晩)이 처음에 둘러싸고 지켜서 적을 지치게 하려 하였는데, 정충신(鄭忠信)이 말하기를 “지금의 계책으로는 곧바로 안현에 올라가 적과 싸우는 것만 못하다. 이것은 병법에 이른바 먼저 북쪽 산을 차지한 자가 이긴다는 것이다” 하니 남이흥(南以興)이 그 계책을 찬성하였다. 이에 정충신 등이 밤을 틈타 안현에 진을 쳤다. 적은 이미 거침없이 진격하여 대궐을 침범하였으므로 대적이 없다고 스스로 믿고 싸우지 않아도 패주시킬 수 있다고 여겼다. 이튿날 아침에 무리를 전부 출동시켜 성을 나와 길을 나누어 전진하였는데 험한 곳을 우러러보고 공격하므로 포탄과 화살이 적중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제장들은 또한 적을 성에 들어오게 한 죄를 스스로 알고 죽기를 각오하고 힘껏 싸웠는데 이미 지세가 험한 데를 얻은 데다가 하늘이 또 도와서 교전하는 처음에 풍세가 갑자기 바뀌었다. 관군이 승세를 타게 되자 사기가 절로 배나 되었다. 적이 드디어 크게 패해서 달아났는데, 적병 4백여 급(級)을 베고 3백여 인을 사로잡았다. 적이 남은 무리를 거느리고 수구문(水口門)을 거쳐 달아나자 유효걸(柳孝傑)이 20여 기(騎)를 거느리고 추격하였다. 이 싸움에서 선천 부사(宣川府使) 김경운(金慶雲)이 앞장서서 힘껏 싸우다가 탄환에 맞아 죽었다.

(官軍與賊, 大戰于鞍峴, 賊兵大敗遁走. 初适立大功於靖社之日, 而朝廷待之, 不能滿其意, 适自恃其能, 輕視國家, 乃陰謀不軌. 及其子將被拿, 脅其麾下, 與明璉連謀, 擧兵而叛. 兩賊俱善用兵, 意在乘虛直擣, 元帥以下, 恇怯逗撓, 莫敢交鋒。 及馬灘之敗, 兵勢益挫, 賊如履無人之地, 遂入京城. 諸將踵後而至, 元帥張晩, 初欲環守以困賊, 鄭忠信曰: “今計莫如直上鞍峴, 與賊決戰. 此兵法所謂先據北山者勝也.” 南以興贊其計. 於是忠信等, 乘夜陣于鞍峴. 賊旣長驅犯闕, 自恃無敵, 謂可不戰而敗之, 詰朝擧衆出城, 分道以進, 仰險而攻, 砲矢不能中人.
諸將亦自知縱賊入城之罪, 殊死力戰, 旣得地險, 天又助順. 交戰之初, 風勢忽反, 官軍乘勝, 士氣自倍。 賊遂大敗奔還, 斬賊兵四百餘級, 擒三百餘人. 賊率其餘衆, 由水口門遁走. 柳孝傑率二十餘騎, 追之. 是役也, 宣川府使金慶雲, 挺身力戰, 中丸而死.)
이괄이 안현에서 패배한 건 잘된 일이었나?
실록의 기록으로 보면 이괄(李适)은 인조반정 때 큰 공을 세웠음에도 2등공신에 봉해지는 등 논공행상(論功行賞)에서 홀대를 받은 데 반감을 품고 난(亂)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사실 반정 음모를 이이반이 고변했는데 어인 까닭인지 광해군은 즉각 대처하지 않았다고 한다. 위협을 느꼈는지 반정군의 총대장을 맡은 김류가 나타나지 않아 이괄이 반정 군을 이끌었으니 일등공신이 되고도 남음이 없었다. 그러나 항상 일이라는 것이 주도권을 잡은 세력의 손에서 결정되니 이괄도 억울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천하의 역적으로 믿어왔던 이괄을 다른 시각에서 보는 관점이 있다. 반정 후 평안병사 겸 부원수에 임명된 이괄은 평안도 영변에 출진해 군사 훈련에 힘쓰는 한편 성책(城柵)을 보수해 진의 방비를 엄히 하였다. 당시 후금과의 국제 관계가 긴박해지면서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불만에 가득차서 난을 일으킬 역신(逆臣)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1624년 정월에 이괄이, 외아들 이전(李栴), 한명련(韓明璉), 정충신(鄭忠信), 기자헌(奇自獻), 현집(玄楫), 이시언(李時言) 등과 함께 반역을 꾀한다는 무고를 받으면서 불거졌다. 이괄도 어려움을 겪었고, 이어 서울에서 선전관과 의금부도사 등이 이괄의 군중(軍中)에 머물던 아들 이전을 조사차 서울로 압송한다는 명목으로 영변에 내려왔다. 서울로 압송되어 추국(推鞫)을 받으면 그 결과가 어떨 것이라는 것을 이괄은 이미 감지했을 것이다. 이괄은 이들을 죽이고 난(亂)을 일으켰다.
난은 이곳 안현에서의 전투로 실패로 끝났다. 안현 정상에서 무악재를 내려다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고개를 든다. 이괄의 난이 실패로 끝난 것은 과연 잘 된 것일까? 반정세력이 조선이 막을 내리던 날까지 나라를 이끌어간 것이 이 땅에 도움이 된 것일까? 힘을 가진 이, 갑(甲)의 위치에 있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은 언제나 유효한 것 같다.

“신촌 벌판으로 천도” 의견 나오기도
안산 정상을 내려가기 전 이화여대, 연세대, 서강대, 홍익대가 자리 잡은 신촌 벌판을 내려다본다. 저 너머로 한강 줄기가 도도히 흐른다. 그 뒤로는 김포, 인천 땅이 보이고 서해 바다가 자리 잡고 있다.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세우면서 찜찜했을 송도(松都)를 버리고 새로운 도읍을 정해 수도를 옮기고자 열망하였다. 태조는 주인을 몰아낸 그 땅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 자신만의 새 도읍을 세우고 싶었을 것이다. 안일한 아랫것들, 고려조 신하들은 500년 살아온 그 터전을 벗어나기 싫어 여러 이유를 대며 송도나 그 가까운 곳에 새 궁궐을 짓자고 한다. 태조실록에는 이때의 일들이 세세히 기록되어 있다. 최창조 교수의 ‘한국의 자생풍수’에는 이때의 일을 태조실록을 바탕으로 이해가 잘되도록 설명하고 있다.
동적 풍수와 정적 풍수의 대결
태조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니 천도(遷都)하기로 의견은 정해졌는데 어디로 갈 것이냐가 또 큰일이었다. 그 과정에서 계룡산 남쪽 땅(신도안)에 공사가 이루어지기도 했고, 개국공신 하륜(河崙)은 무악(毋岳, 안산) 남쪽 지금의 네 대학이 자리 잡은 신촌 벌판이 최적지라는 강력한 주장을 내세운다. 그 이론적 근거가 지리(地理)인데 여기서 지리란 송(宋)나라 호순신(胡舜臣)의 지리신법(地理新法)이란 책의 이론을 따른 것이다. 상대적 개념이 도선국사로 대표되는 도참(圖讖)인데 도참은 땅의 형세에 따라 길흉(吉凶)이 정해진다는 형세론임에 반해, 지리신법은 오행(五行)이나 십이변(十二變), 구성(九星) 등 이기론(理氣論)이라 한다.
한마디로 동적(動的) 풍수 이론으로 정적(靜的) 풍수 이론을 누르며 천도 주장을 한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으니 태조는 직접 안산으로 온다. 아마도 안산 정상에 올라 신촌 벌판을 바라보았을 것이다. 하륜을 빼고는 대부분의 풍수사와 신료들은 신촌벌(毋岳 南쪽)이 좁다고 반대를 한다. 대안은 없고, 송도가 제일 좋다 하고, 모처럼 나온 장소는 반대에 부딪치고 하니 태조도 답답했을 것이다. 이때의 실록 기록을 보자. 태조 3년(1394년) 8월의 일이다.
임금이 무악(毋岳: 안산)에 이르러서 도읍을 정할 땅을 물색하는데, 판서운관사 윤신달(尹莘達)과 서운 부정 유한우(劉旱雨) 등이 임금 앞에 나와서 말하였다.
“지리의 법으로 보면 여기는 도읍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임금이 말하였다.
“그대들이 근거 없이 옳거니 그르거니 하는데, 여기가 만일 좋지 못한 점이 있으면 문서를 근거로 이야기하라.”
신달 등이 물러가서 서로 의논하였는데, 임금이 한우를 불러서 물었다.
“이곳이 끝내 좋지 못하냐?” 한우가 대답하였다.
“신이 보는 바로는 실로 좋지 못합니다.”
임금이 또 말하였다. “여기가 좋지 못하면 어디가 좋으냐?”
한우가 대답하였다. “신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말하였다.
“네가 서운관이 되어서 모른다고 하니, 누구를 기망하는 것인가? 송도(松都)의 지기(地氣)가 쇠하였다는 말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한우가 대답하였다. “이것은 도참(圖讖)으로 말한 바이며, 신은 단지 지리만 배워서 도참은 모릅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옛사람의 도참도 역시 지리로 인해서 말한 것이지, 어찌 터무니없이 근거 없는 말을 했겠느냐? 그러면 너의 생각에 쓸 만한 곳을 말해 보아라.”
한우가 대답하였다.
“고려 태조가 송산(松山) 명당(明堂)에 터를 잡아 궁궐을 지었는데, 중엽 이후에 오랫동안 명당을 폐지하고 임금들이 여러 번 이궁(離宮)으로 옮겼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명당의 지덕(地德)이 아직 쇠하지 않은 듯하니, 다시 궁궐을 지어서 그대로 송경(松京)에 도읍을 정하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장차 도읍을 옮기기로 결정했는데, 만약 가까운 지경에 다시 길지(吉地)가 없다면, 삼국 시대의 도읍도 또한 길지가 됨직하니 합의해서 알리라” 하고, 좌시중 조준(趙浚)·우시중 김사형(金士衡)에게 일렀다.
“서운관이 전조 말기에 송도의 지덕이 이미 쇠했다 하고 여러 번 상서하여 한양(漢陽)으로 도읍을 옮기자고 하였었다. 근래에는 계룡산이 도읍할 만한 땅이라고 하므로 민중을 동원하여 공사를 일으키고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이제 또 여기가 도읍할 만한 곳이라 하여 와서 보니, 한우 등의 말이 좋지 못하다 하고, 도리어 송도 명당이 좋다고 하면서 서로 논쟁을 하여 국가를 혹세하는 것이니, 이것은 일찍이 옛것을 징험하지 않은 것이다. 경 등이 서운관 관리로 하여금 각각 도읍될 만한 곳을 진술하게 해 보고하라.”
이에 겸판서운관사 최융(崔融)과 윤신달·유한우 등이 상서하였다.
“우리나라 내에서는 부소(扶蘇: 송악산 아래) 명당이 첫째요, 남경(南京: 한양)이 다음입니다.”
이날 저녁에 임금이 무악 밑에서 머무셨다.
(上至毋岳, 相定都之地。 判書雲觀事尹莘達、書雲副正劉旱雨等進曰: “以地理之法觀之, 此地不可爲都。” 上曰: “汝等妄相是非。 此地若有不可, 則考諸本文以聞.” 莘達等退, 相與論議。 上召旱雨問之曰: “此地竟不可乎?” 對曰: “以臣所見, 實爲不可。” 上曰: “此地旣不可, 何地爲可?” 旱雨對曰: “臣不知。” 上怒曰: “汝爲書雲觀, 謂之不知, 欺誰歟? 松都地氣衰旺之說, 汝不聞乎?” 旱雨對曰: “此圖讖所說。 臣但學地理, 未知圖讖。” 上曰: “古人圖讖, 亦因地理而言, 豈憑虛無據而言之? 且言汝心所可者.” 旱雨對曰: “前朝太祖相松山明堂, 作宮闕, 而中葉已後, 明堂久廢, 君王屢徙離宮。 臣疑明堂, 地德不衰, 宜復作闕, 仍都松京.” 上曰: “予將決意遷都。 若曰近境之內, 更無吉地, 則三國所都, 亦爲吉地, 宜合議以聞.” 乃謂左侍中趙浚、右侍中金士衡曰: “書雲觀在前朝之季, 謂松都地德已衰, 數上書請遷漢陽, 近以雞龍爲可都, 動衆興役, 勞擾生民, 今又以此地爲可都, 及其來觀, 則旱雨等曰: 不可, 反以松都明堂爲可, 互相爭論, 以誣國家, 是曾無所懲故也。 卿等趣令書雲員吏, 各陳可都之地以聞.” 兼判書雲觀事崔融及尹莘達、劉旱雨等上書以爲: “一國之內, 扶蘇明堂爲上, 南京次之.” 是夕, 上次于毋岳下.)
이 기사를 보면 태조는 안산에 오르고 그 아래에서 숙박할 정도로 힘썼으나 신하들은 진취적으로 일을 떠맡은 이가 없고 태조가 밀어 붙인다. 답을 내 각각 말하라는 엄명이 떨어진다. 이제 결론의 기사로 가자.
도평의사사에서 상신(上申)하였다.
“…중략… 삼가 한양을 보건대, 안팎 산수의 형세가 훌륭한 것은 옛날부터 이름난 것이요, 사방으로 통하는 도로의 거리가 고르며 배와 수레도 통할 수 있으니, 여기에 영구히 도읍을 정하는 것이 하늘과 백성의 뜻에 맞을까 합니다. 왕지(王旨)가 내려졌다. 아뢴 대로 하여라.
(都評議使司所申: …중략… 竊觀漢陽, 表裏山河, 形勢之勝, 自古所稱, 四方道里之均, 舟車所通。 定都于玆, 以永于後, 允合天人之意.” 王旨依申)
이렇게 한양 천도가 결정되었다. 안산까지 오르고 그 아래에 머물러 가면서까지 일을 밀어붙이고 명쾌한 결론을 낸 리더 태조에게 박수를 보낸다. 신하들에게 맡겨 놓았다면 끝내 천도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갑론을박(甲論乙駁)이 계속되었을 것이다. 지금 전국을 돌아보아도 이곳 서울(한양)만한 땅이 또 있을까.
한양 천도의 단초는 태조의 무악(毋岳) 거둥에서 이루어졌으니 600년 수도 서울의 중요한 획을 그은 곳이 무악이다.

가재 잡고 산토끼 쫓던 안산 고개
이제 무악(안산, 안현)을 내려간다. 300m도 되지 않는 도성 밖 조그만 산이지만 조선 500여 년 간 한양의 관문으로 제 자리를 지켜 온 산이었다. 이번 글을 쓰면서 몇 개의 이야기를 둘러보았지만 숨겨진 이야기가 많고도 많을 것이다. 어려서는 이 산 골짜기에서 가재도 잡고 산등성이에서 산토끼도 쫓았다.
봄이면 무슨 까닭인지 등성이에 산불도 잦았다. 그때는 동네 개구쟁이들이 우루루 뛰어올라 나뭇가지로 불을 끄기에 바빴다. 불이 잘 꺼지면 어느 때는 이화여대에서 감사하다는 연락도 오고, 감사장이 오기도 했는데 어울리지 않게 전교생이 모인 아침조회에서 교장 선생님 부름을 받아 교단 위에 올라가게 되고 착한 어린이가 되기도 했으니 우리 개구쟁이들은 그저 부끄러울 뿐이었다. 그냥 놀이 삼아 한 일이었으니까.
안산 봉화대에서 홍제천 백련산으로 내려가는 하산 길은 서너 개 코스가 있다.

직선 코스는 정상 앞 헬기장에서 바로 뒤(북쪽)로 내려가는 길이다. 가파르기는 해도 흙 길이라서 어려움은 없다. 제일 편한 길은 서쪽 무악정을 거쳐 메타세콰이어 숲길을 지나는 길이다. 남쪽 봉원사 방향으로 내려와 무악의 바위봉을 휘감아 도는 길은 깊은 산속을 지나는 듯한 묘미가 있다. 너와집도 있고, 성혈(星穴)이 선명한 바위도 만난다. 아쉬운 일은 이 길 곳곳에 숨어 있는 많은 약수(藥水)가 음용불가 판정을 받은 일이다.

이 길에서는 박두진 시인의 시비도 만나고, ‘모범 경작생’을 쓴 이무영 작가의 문학비도 만난다. 연세대에서 후학을 길렀던 분들이라 안산에 비를 세웠으리라. 또 많은 독립운동가를 알리는 작은 현수막도 많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셨구나….
하산 지점에 오면 아름다운 꽃밭이 화사하다. 애들 말로 짱이다. 이윽고 만나는 모래내(沙川, 홍제천)에는 물방아도 설치했고 자연 암장(巖嶂)에 인공폭포도 만들어 놓았다. 옛 지도의 상암(裳巖: 치마바위)이 이 바위인가 보다. 개울물에는 잉어를 비롯한 민물고기가 헤엄친다.
백련과 청련의 조화 못 지킨 불교계
이제 길을 건너 서대문 등기소 방향으로 간다. 백련산으로 오르는 길이다. 홍연초등학교 지나 가좌배수지를 만나는데 여기에는 ‘해병대 104고지 전적비’가 서 있다. 1950년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에 이어 9.28 서울 수복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게 한 연희고지 전투를 기리는 전적비이다.

이 길을 따라 가면 천년고찰 백련사(白蓮寺)가 기다리고 있다. 옛 서울 지도 ‘도성도’에 淨土(정토)라고 쓴 것은 이 절을 표시한 것이다. 본래 절 이름이 정토사(淨土寺)였다. 절 안내문에 따르면 신라 때 창건한 절인데, 세조의 큰딸 의숙공주(懿淑公主)가 남편 정현조(鄭顯祖)의 극락왕생을 빈 공주의 원찰이었다 한다. 절 이름도 백련사(白蓮寺)로 바꾸었다 .
잠시 방향을 돌리면 왕십리 무학산(無學山) 아래에는 역시나 천년 고찰 청련사(靑蓮寺)가 있었다. 한때 안정사란 이름이 붙기도 했다. 조계종과 태고종 사이에 합의를 못 보아 아파트 업자에게 팔려 연전(年前) 사라진 가슴 아픈 절이다.
동쪽에 청련(靑蓮), 서쪽에 백련(白蓮)의 조화는 이제는 없다. 백련사는 공주가 남편의 극락왕생을 빌었듯이 서방정토사(西方淨土寺)란 편액도 보인다. 아미타불을 모신 극락전 벽화에는 서방정토로 떠나는 반야용선(般若龍船)이 물길을 헤치면서 나아가고 있다. 이 절 넘어 신사동(新寺洞) 쪽은 예전 ‘고태골’이라고 부르던 곳이다. 공동묘지가 많았다. 이 영혼들도 모두 서방정토로 안내하던 절이었으리라. 서대문밖 애들은 상대를 겁줄 때 “까불면 고태골로 보낸다”고 했다. 요즈음 표현으로 하면 “벽제로 보낸다”쯤 될까.
백련사를 뒤로 하고 이제 백련산으로 오른다. 평탄한 흙길이다. 오랜 절이 있는 산이다 보니 절 이름을 따서 백련산이 되었다. 최고봉은 달리 응봉(鷹峰)이라고도 부르는데 은평정이라는 정자를 세워 놓았다. 응봉(매봉)은 고유명사라기보다는 동네 산을 말하는 일반명사이다. 산 남쪽 품에는 문 대통령 잠룡(潛龍) 시절 사저(私邸)가 있었다. 산은 작아도 현직 대통령을 배출한 산이다.
평탄한 흙길을 따라 녹번고개로 향한다. 녹번고개에는 지자체가 인왕산, 북한산으로 연결되는 생태 다리를 이어 놓았다. 우리처럼 배낭 메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맙기 그지없는 일이다. 길을 건너 녹번고개에 이르면 작은 굴이 있는데 쓰여 있기를 ‘산골 판매소’라 했다. 발음은 ‘산꼴’이 아니고 부드럽게 ‘산골’이라 해야 한다. 의미는 山骨(산골)이니 ‘산의 뼈’라는 말이다. 산의 뼈(bone)?

‘산골’ 난다 하여 녹번동
한경지략(漢京識略)에 소개된 녹번현(녹번 고개)에 대하여 읽어 보자.
“사현(무악재) 북쪽에 있다. 이 재의 석벽에서 자연 동이 산출된다. 이것을 채굴하는 사람들이 쇠정으로 석벽을 파면 돌 사이에 은 입자 같은 것이 나오는데 파란 빛의 광채가 난다. 뼈 부러진 사람이 먹으면 신기한 효험이 있다. 복용법은 미음과 함께 그 가루를 날로 먹는데, 먹을 때 꼭 낫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효험을 본다고 한다. 이 약은 골절에 잘 듣는데, 지금은 다른 병에도 좋다고 하니 기이한 일이다.(碌礬峴在沙峴北 此峴石壁今産自然銅 採者鐵錐斸壁則石間有物如銀粒靑瑩有光 病人服之神效 其服法以米飮生呑其屑而呑時必默禱其病療則有效云 此藥宜於折骨而今宜於他病亦是異事也)
예전 낙상을 하여 뼈에 손상이 있을 때 이 산골(푸른빛의 동 화합물)을 가루 내어 먹으면 낫는다 해서 접골원에 가거나 산골을 사 오던 어른들 모습이 떠오른다. 녹번이라는 지명은 이 자연동 녹반(碌礬)에서 유래되었다 한다. 이제 안산 백련산 편을 마무리한다. <다음 회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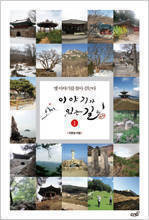
<이야기 길에의 초대>: 2016년 CNB미디어에서 ‘이야기가 있는 길’ 시리즈 제1권(사진)을 펴낸 바 있는 이한성 교수의 이야기길 답사에 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3~4시간 이 교수가 그 동안 연재했던 이야기 길을 함께 걷습니다. 회비는 없으며 걷는 속도는 다소 느리게 진행합니다. 참여하실 분은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사 연락처 010-2730-7785.
- 관련태그
-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제649-650호
제649-65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