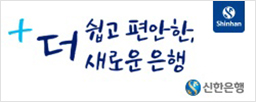(문화경제 = 이종영 전 경희대 음대 학장) 오페라 이야기를 시작함에 있어 왜 키에르케고르(Kierke gaard)가 자신의 대표작인 ‘Either, or’에서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음악 이야기, 특히 모차르트(Mozart)의 돈 조반니(Don Giovanni)에 대해 수십 쪽을 논했는지 이해가 간다. 자신이 잘 모르는 너무 매력적인 예술에서 느끼는 경이로움이 아니었을까?
음악이라는 특별한 예술 매체는 네 사람이 각각 다른 내용의 이야기를 동시에 떠드는 것도, 표현을 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고 이해도 할 수 있게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장 추상적이며 시간 예술이라는 특성을 가진, 여러 가지 얼굴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예술 형식이기에.
모차르트의 음악은 한없이 천사 같지만(angelic) 돈 조반니가 이야기하는 가사의 가끔 끔찍함에 놀라고 웃는다.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가사에 그런 천진난만한 음악을 부칠 수 있느냐 하는데, 오로지 모차르트만이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그의 장난스러움이 즐겁게 표현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필자가 오랜 세월 교향악단이나 실내악을 첼로로, 모차르트를 진지하게 생각하며 연주하던 때를 부끄럽게 만드는 순간들이다. 그만큼 모차르트는 인생의 모순과 ‘joy of life’를 잘 안 작곡가이다.
다니엘 바렌보임(Daniel Barenboim)이 왜 우리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를 알아야 하는 이유로, “그것을 아는 것이 모르고 있었을 때보다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베토벤의 특히 후기 피아노 소나타를 모르는 것은 삶의 깊이를 그만큼까지 들어가 보지 못한 것처럼 느낄 수 있다. 스쿠버 다이버(scuba diver)가 물속 깊이 들어가지 않아 본 것처럼.

베토벤은 돈 조반니의 주제가 비도덕적이라고 비판했지만 브람스, 로시니, 구노, 바그너(Wagner) 등이 가장 훌륭한 오페라라고 생각한 돈 조반니를 체험하지 못한 삶은 그만큼 덜 풍요로울 것이다. 말러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토스카니니, 번스타인이 가장 훌륭한 희곡 오페라라고 극찬한 베르디(Verdi)의 ‘폴스타프(Fallstaff)’ 역시 알고 나면 삶의 기쁨을 많이 더해 줄 것이지만 사실상 모르고 지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안 됐다는 생각이 든다.

오페라를 아는 인생과 모르는 인생
필자가 이 시리즈를 쓰기로 한 제일 큰 동기는,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고 풍요로운 오페라의 세계에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다. 워낙 방대한 종합 예술이다 보니 오페라의 줄거리와 문학적인 배경도 알아야 하고 베르디의 돈 카를로(Don Carlo)처럼 많은 역사적인 이야기를 다룬 그랜드 오페라(grand opera)의 경우는 역사적인 배경도 이해해야 한다. 바로크 시대의 오페라는 그리스 신화의 스토리를 알아야 한다든가 바그너의 오페라 역시 북유럽(Nordic) 신화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으면 이해하기 힘들다.
거기다 오페라를 만드는 독특한 요소인 ‘레시타티브’ 역시 다른 종류의 음악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기에 오페라의 탄생과 레시타티브의 음악적 요소부터 알아야 한다. 그리고 심포니나 솔로 곡들과는 다르게 오페라는 어떠한 드라마틱한 요소를 전개시키고 있느냐가 전체 곡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기에 교향곡이나 솔로 음악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접근방식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필자도 한동안 오페라가 부르주아나 즐길 수 있는 예술이라고 생각해 그 가치를 인정하기 싫어한 때가 있었다. 왜 그렇게 모차르트가 오페라를 제일 쓰고 싶어했는지,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스승이었고 당대에 가장 존경받고 가장 인기 있으며 위대했던 하이든이 모차르트를 자기가 아는 제일 위대한 작곡가이고 앞으로 100년 이후에도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한 것을 필자가 확실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우리가 작곡가의 위대성을 평가할 때 그 작곡가가 기악을 잘 다루는(instrumental) 작곡가일 뿐 아니라 얼마나 노래(voice)를 위한 작품도 잘 쓸 수 있는 작곡가였느냐가 위대성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때가 종종 있다. 두 가지 종류의 음악을 전부 능숙하게 다룰 수 있었던 모차르트이기에 하이든이 모차르트를 가장 훌륭한 작곡가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가끔 셰익스피어의 제일 유명하다는 4대 비극의 끔찍함에 놀라곤 한다. 그리고 많은 오페라의 끔찍한 스토리에 대해서도 현실과 먼 이야기들만 다루었다고 느낄 때도 있었다. 그러나 내가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점점 이 끔찍한 이야기들이 주위에 자주 일어나는, 쉽게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알아간다. 괴테의 사랑에 목숨 바친 베르테르의 스토리, 권력의 욕심으로 무너져가는 맥베스 이야기, 재산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생기는 리어왕 이야기는 우리 주위에 언제나 일어나는 비극들이다.

신분의 갈등 속에서 비극으로 끝난 라 트라비아타(La Traviata)의 비극, 한 여자를 잘못 사랑해서 파멸로 끝난 오페라 카르멘의 돈 호세(Don Jose) 이야기, 더욱이 이야기가 춤과 음악으로 어우러져 한층 고조되고 정화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오페라는 잊을 수 없는 체험으로 생생하게 우리에게 남을 수밖에 없다. 이 또한 우리가 주위에서 자주 보고 나 자신에게도 일어나는 일이기에 인류 전체에게 공감대를 이룬다.
‘노래로 하는 이야기’가 수백 년 내려온 이유
처음에는 말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노래로 하는 드라마’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고 지금도 성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시대에 따라 작은 변화와 유행에 따라 변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변하지 않는 클래식한 영구적인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음이 틀림없다.
교향곡만 해도 역사가 오페라처럼 길지 않고 내용 또한 방대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 접근이 비교적 간단하고 역사적 접근이 교향곡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실상 오페라의 sinfonie, 소위 overture가 교향곡의 시작이다.
언젠가는 오페라도 역사적 접근을 해야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하다못해 헨델의 오페라마저도 지금 현대인들이 듣기에는 고색창연하게(archaic하게) 느낄 수 있고 지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대한 장르를 처음부터 역사적으로 접근하다가는 관객이나 독자를 전부 잃어버릴 수 있다. 영화 관객이 다양하듯 볼거리만으로도 오페라는 아주 즐거울 수 있다. 더군다나 과거 TV도 없고 음반도 없던 시대에 얼마나 오페라의 볼거리가 재미있었을지는 가히 짐작할 만하다.
소리를 복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세렝게티 평원에서 직접 본 야생동물들을 영상으로 복제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기 때문에 오페라의 현장 체험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기에 17세기 베니스에서는 새로 나오는 오페라가 1년에 50편이 넘었고, 귀족이 아닌 보통 사람들이 표를 사서 가는 오페라 하우스가 7개나 있었다고 한다. 그 당시 베니스 인구는 지금 기준으로는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도 그렇다. 오페라 하우스라 할 만한 곳이 하나밖에 없는 1000만 인구의 서울에 비한다면 그 차이를 대략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영화도 한때 ‘벤허’나 ‘십계’ 같은 대형 영화가 돈도 많이 벌고 많은 관객을 불러오는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베르디(Verdi)의 ‘아이다(Aida)’처럼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는 그랜드 오페라(grand opera)가 성공의 척도처럼 생각된 적도 있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나 ‘피가로의 결혼(Marriage of Figaro)’는 어쩌면 음악가나 예술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오페라지만, 일반 청중들에게는 푸치니의 오페라들이 훨씬 즐겁고 보기 쉬울 수 있다. 지금 가장 많이 상영되는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나 비제(Bizet)의 ‘카르멘(Carmen)’도 첫 공연은 실패로 끝났었다.
‘라 트라비아타’의 경우는 비올레타(Violeta) 역을 살찐 여자가 맡아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방종함(easy virtue)을 지닌 하류층 여자가 주인공이었다는 점이 위선적이고 이중잣대를 가진 파리의 부르주아에게는 시기상조였던 것이다. 그렇게 훌륭한 오페라를 작곡한 비제는 ‘카르멘’의 실패로 인한 슬픔으로 일찍 생을 마감했다.
드라마 만드는 천재성 지닌 오페라 작곡가들
우리가 아는 위대한 작곡가 중에는 위대한 오페라를 안 쓴 작곡가가 많다. 브람스, 슈베르트, 슈만 다 위대한 성악곡들은 썼지만 좋은 오페라는 남기지 못했다. 좋은 리브레토(libretto)를 쓸 파트너를 만날 수 없었던 불운도 있겠지만 오페라를 만들 극적인 센스(dramatic sense)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유도 있으리라. 베토벤(Beethoven)처럼 성악곡 작곡이 힘들었던 작곡가도 있고, 말러처럼 성악이 들어간 교향곡은 썼지만 오페라는 안 쓴 작곡가도 있다. 베르디처럼 주로 오페라만 썼다고 위대한 작곡가로 평가하는 데 손색이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좋은 오페라 작곡가가 되기 위해선 특별한 드라마를 만들 천재성은 지니고 있어야 한다.
베르디, 로시니, 벨리니, 도니체티, 푸치니, 바그너 등 주로 오페라만 작곡한 작곡가들의 천재성이나 위대성이 오페라를 안 쓴 다른 작곡가들과 비교할 때 부족함이 없다. 따라서 오페라를 모르는 것은 음악의 중요한 부분을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고 이것을 알려면 특별한 지식을 쌓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인류가 커뮤니티(community)를 이루고 살고 문명(civilization)이 탄생한 이래 동서양을 막론하고 스토리에 음악을 더한다든가 춤을 더하는 일은 어느 문화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일들은 흥을 더 돋우거나 한편으로는 지적인 계급이나 권력의 상징으로 이용된 때가 있었다(루이 14세나 여러 귀족 집안의 사례에서).

다행히 우리나라에도 판소리가 보존되어 있어 ‘한국판 오페라’ 같은 감성을 체험할 수 있다. 인도나 인도네시아 문화권에도 춤과 스토리와 음악이 잘 어우러진 형태가 전수되어 내려온 것을 보며 이러한 예술 작품들이 많이 사라진 서양 문화를 추측해 내는 데 도움이 된다. 서양 문화에서는 음악이나 춤의 형태로는 잘 남아 있지 않지만 연극이나 문헌으로 남은 문학 속에서 우리는 많은 그리스의 연극이 노래로 되어 있음을 안다.
사실상 오페라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서양에서 16세기 후부터이다. 심리학(psychology)이라는 단어가 현대에 와서 생겨났듯이, 오페라라는 단어의 등장은 음악으로 이야기하는 듯한 레시타티브라는 고유의 음악이 생긴 후부터의 일일 것이다.
음악이 있는 드라마는 그리스 이전부터도 존재했었을 것이다. 음악과 드라마가 얼마큼 분리되어 있느냐의 차이가 작품의 차이, 시대의 차원을 넘어가며 변천해 왔을 것이다. 그리스 드라마에서 코러스가 노래했다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Poetics)’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다음 호에 계속)
이종영 전 경희대 음대 학장 첼리스트로서 이화여고 2학년 때 제1회 동아일보 콩쿠르에 1등을 했고, 서울대 음대를 거쳐 맨해튼 음대 학사, 석사를 마쳤다. Artist international 콩쿠르 입상, 뉴욕 카네기 홀 연주, 아메리칸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 등으로 활약했다. 예술의 전당 개관 및 10주년 기념 폐막 연주 등 수많은 연주 활동을 펼쳤으며 1996년 Beehouse Cello Ensemble을 창단하고 사단법인을 만들어 음악감독으로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다.
- 관련태그
-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제680호
제68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