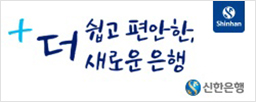(문화경제 = 최영태 편집국장) 이번 주 ‘문화경제’는 MZ세대(‘1988년 용띠’를 중심으로 하는 밀레니얼 세대와 1995년 이후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를 위해 명품 매장을 꾸미거나 모바일을 이용해 판매하는 등 혁신에 나선 백화점 3사를 다뤘다(52~59쪽).
한국의 젊은층이 명품을 좋아한다는 사실은 공지사항이다. 아니, 한국인 전체가 명품을 좋아한다. 그래서 한국인은 외모적으로 멋있다. 특히 젊은층은 값비싼 명품이 아니더라도 자잘한 소품 등을 아주 세심하게 고르기에 멋있어 뵌다.
명품과 관련해 폐부를 찌르는 이야기로는 이런 게 있다. 알바를 하면서 힘들게 살지만 돈을 모아 어쩌다 한 번쯤은 ‘명품’ 음식을 소비하는 젊은이에게 장노년층이 “돈 없어 고생하면서 어떻게 그런 비싼 음식을 사먹나?”고 핀잔을 주면 “이런 것도 못 사먹냐?”고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는 얘기였다.
명품에는 분명 그런 속성이 있다. 아무리 쪼들리더라도, 아니, 쪼들릴수록 명품 정도는 사서 쓸 줄 아는 마음의 여유, 품격, 배포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항상 징징 짜는 것(희망 제로)보다는, 때로 명품도 사는 마음의 여유(미래에 대해 희망적)가 미래 설계에는 더 유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 나가면 깜짝 놀라는 경험을 한다. 물론 개인차가 있다. 둔감한 사람들은 “우리랑 똑같은데 뭐가 놀라워?”고 반문한다. 이처럼 둔감한 사람들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차이(별남, 독창성, 나만의 인생)를 만들기엔 역부족이라 생각된다.
한국인에겐 너무 상식적인 모습이 외국인에게는 깜짝 놀랄 요소가 되기도 한다. 미국계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와, 중국계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는 대담하며 이런 말을 했다. “한국에는 거의 모든 곳에 ‘표준-상식’이라는 게 있다. 거기에 맞는 사람에게는 아주 따뜻하지만 벗어나면 막 대한다”(안유화) “미국에 상사와 부하가 있지만 직책에 따른 구분일 뿐이고 사장은 ‘신분에 맞게’ 비행기 1등석-비즈니스석을 타고, 사원은 이코노미석 위로 올라가면 안 되는 그런 상식은 없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신분사회-계급사회다”(존 리)라는 요지의 말이었다.

한국의 수많은 표준과 규격과 그럴듯함
한국이 신분-계급 사회라는 말은 “우리가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라는 자부심을 갖는 한국인에게는 쇼킹하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존대어(상대를 높임으로써 나를 낮추는)가 발달한 게 일본이고 그다음이 한국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위-아래가 분명한 우리 사회가 틀림없다.
‘한국 일상생활에 아주 촘촘하게 마련된 표준 또는 규격’이란 다음과 같다. △대학은 적어도 SKY 정도는 나와줘야 한다 △대졸 뒤 대기업 레벨의 그럴듯한 직장에 들어가 일정 직급까지 승진해줘야 한다 △복식은 때와 격식에 맞춰 보기 좋은 수준은 입어줘야 한다 등등이다. 이른바 ‘정통’이 정해져 있고, 여기서 벗어나면 한국인은 상대방을 ‘하대할’ 준비를 한다. 명품 소비도 이런 표준-규격의 하나 아닌가?
한국 사회의 규격-표준화에는 분명 무서운 측면이 있다. 일본 와세다대학 경제학과의 박상준 교수가 있다. 서울대를 나와 1999년부터 일본에서 교수를 하고 있다. ‘불황터널’(2016년)과 ‘불황탈출’(2019년)을 펴낸 그는 한국 방송 인터뷰에서 항상 말조심을 한다. “제가 이런 말을 해도 화를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립적인 발언을 하려고 항상 조심하는데 그래도 혼난 적이 많아서…”라면서.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이중심리는 놀라울 정도다. 이른바 보수 언론들은 내적으로는(일본어로 표현하면 ‘혼네’) 친일 또는 일본 숭상적이면서도 겉으로는(다테마에) ‘민족 언론’을 표방한다. 그러니 항상 일본에 대해 얘기하다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기 십상이다. 한국인 또는 한국 언론이 공식적으로 일본 또는 일본인에 대해 하는 발언에는 표준-규격이 있다. 이 규격에서 벗어나면, 설사 그것이 그냥 팩트이더라도, 박상준 교수처럼 큰 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박 교수는 ‘불황탈출’에서 이렇게 썼다.
헤드라인 뉴스는 (한국의 징용공) 배상 판결이 아니고 “왜 베트남 구직자들은 일본보다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가”를 묻는 탐사보도였다. (중략) 일본에는 한국의 경험에서 일본을 위한 지혜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다.(33-34쪽)
그러면서 그는 버블 붕괴로 공포에 빠졌던 2001년에 일본에서 ‘유행어 대상’을 받았다는 말 “두려워 말고 겁먹지 말고 사로잡히지 말자”를 소개했다. 한국처럼 규격-속박이 많기에, 그리고 불황을 맞아 얼어붙은 일본인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말이란다.
명품을 사고, 남의 시선을 ‘절대적으로’ 의식하는 한국인의 마음에는 두려워하고 겁먹고 사로잡히는 측면은 없나? 이렇게 사로잡혀서야 스티브 잡스 같은 독창적인 마인드가, 그리고 아이폰 같은 창조-파괴적인 작품이 나올 수 있나?
한국인의 외모 스캔과 미국인의 “웬 상관?”주의
오랜 미국 생활을 한 뒤 한국에 돌아와 불편했던 점 중 하나는 상점에 가나,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나 ‘스캔부터 당한다’는 점이었다. 미국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두 사람이 만나면 가볍게 인사 정도나 나누면 되지만 한국에선 서로 스캔한다. 상점에 들어가도 점원이 나를 스캔한다. 그래서 가게에 들어갈 때는 “가게에 맞는 복식을 차려입자”라는 생각을 했었다. 물론 가게 갈 일도 없는 비대면 시대인 지금에야 그런 준비도 필요없고, 필자도 이제 엘리베이터에 타면 상대방 스캔부터 한다. 하지만 귀국 뒤 처음에는 그런 게 좀 불편했었다.
명품을 좋아하는 젊은이를 나무랄 생각은 없다. 단, ‘영&리치’라는 본래 취지에 잘 맞았으면 좋겠다. ‘young & not rich but spend. YOL(젊고 부자 아니지만 잘 쓴다. 소확행)’ 식으로 군말이 길어지면 재미가 없다.
최근 부동산 大광풍 때 한껏 값 오른 아파트를 팔아치운 주역은 60대였고, 사들인 주역은 30대였단다. 30대에게 미안하지만, 이래 가지고서야 진정한 ‘영&리치’가 가능은 할까?
- 관련태그
-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제694호
제69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