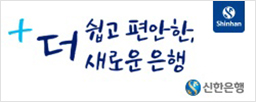(문화경제 = 이한성 옛길 답사가) 매월당은 두뭇개 승사(僧舍) 행사 후 잠시 편안한 시간을 가진 듯하다. 그는 어촌을 둘러보고 한강을 바라보며 시심(詩心)을 느낀다.
태조가 천도한 한양은 본래 신라의 북한산주, 한산군(漢山郡)이라는 이름을 거쳐 고려 숙종 때 남경, 충렬왕 때 한양부(漢陽府)가 되었는데 매월당 시절에도 변함없이 한양이라 불렀다. 조선 후기의 지도 경조오부도에서 보듯이 한양도성으로 둘러싸인 경조(京兆, 민간에서는 흔히 문안이라 불렀음)와 도성 밖 10리까지를 포함한 한성부(漢城府)가 그 영역이었다. 그 남쪽 경계는 한강이었다.
지금은 서울이 강북(江北)과 강남(江南)으로 구분되지만 매월당 시절은 물론 대한민국 수립 후에도 오랫동안 서울(한양)은 영등포를 포함한 한강 이북만이 그 영역이었다.

매월당은 이곳 한강 마을을 다녀 본 듯하다. 경조오부도에서 보듯 서쪽 양화진, 선유도에서 시작하여 광흥창, 마포, 용산, 동작나루, 서빙고, 한강진, 두모포, 저자도, 뽕나무밭(잠실)으로 이어진다. 양화진과 선유도는 한양에서 강화로 가는 길목이었고 동작나루는 과천 지나 수원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한강진은 말죽거리 지나 광주 땅으로 가는 길목이었으니 교통의 요지였다. 군선과 민간선이 부지런히 선객을 실어 날랐다. 마포는 지금도 남아 있는 염리동(鹽里洞)이라는 지명이 말해 주듯 남도에서 서울로 오는 소금의 집산지였고 마포 새우젓동네라는 말이 전하듯 젓갈과 생선의 집산지였다. 광흥창과 용산은 곡물을 비롯한 물산의 집산지였다. 지금의 한강다리가 놓인 곳은 대부분이 나루터여서 강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고기 잡는 이들이 살았고, 강에서 배로 장사 다니는 이들의 쉬어갈 곳이 되기도 했다. 남한강, 북한강의 뗏목과 시목(柴木: 땔나무) 꾼들은 이곳 강마을에 와서 짐을 풀었다.




강화 앞 조강(祖江)에서 밀물에 흘러드는 바닷물은 두뭇개, 저자도 앞까지 밀려오곤 했다. 이른 봄 한강에서는 잉어나 붕어, 숭어, 농어, 장어, 새우, 참게 외에 하구에서 올라오는 계절 생선도 잡히곤 했다. 행주의 웅어와 황복이다. 고깃배들은 분주히 한강을 오르내렸을 것이다. 후세에 그린 그림이지만 겸재 정선의 행호관어도(杏湖觀漁圖)는 조선시대 한강의 웅어 잡이 모습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모습은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도 기록되어 있고 세종실록지리지에도 실려 있으니 봄날 매월당도 이런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제어(鮆魚)는 속명으로는 웅어(葦魚/위어)라고 하는데 한강 하류인 고양군 행주에서 잡힌다. 늦은 봄이 되면 대궐 음식을 준비하는 사옹원(司饔院)의 관리들은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 잡은 웅어를 임금에게 진상하며, 생선 장수들은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횟감 사라고 소리치며 판다.”
鮆魚俗名葦魚産漢江下流高陽幸洲春末司饔院官網捕進供漁商遍街呼賣以爲膾材.

매월당의 시 한 수 보자.
어촌
한 줄기 江, 안개비에 어촌은 어두워지고
포구 가득 비릿한 바람 바다가 가까운 듯
낚싯배는 어디 있나 아직 오지 않고
봄물에 상앗대 반 담그니 밀물 흔적도 묻히는구나
漁村
一江煙雨暗漁村。滿浦腥風接海門。何處釣船猶未到。半篙春水沒潮痕。
그 시절 한강은 지금처럼 물을 가두지 않는(수중보가 없었음) 자연 하천이었기에 여울을 제외하고는 깊지 않았다. 먼 길 다니는 배들은 돛(帆)을 달고 노(櫓)를 저었으나 얕은 강을 건너다니는 배는 상앗대(篙)를 짚으면 충분하였다.
한강에는 먼 길 다니는 배들도 붐볐다. 1700년대에는 조운을 담당하는 대선(大船)만도 80여 척이었다 한다. 김시습이 살던 조선 초기에는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물, 곡물, 잡화, 목재 등의 거래 시장(場)이 京江(양화진, 서강, 마포강, 용산강, 한강, 두뭇개, 송파강, 광진…) 나루를 중심으로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1700년, 1800년대에 이르면 육의전을 비롯한 시내 상권보다 경강 상권이 더 큰 손이 되었다.
매월당은 한강을 다니는 돛배를 바라보았다. 아마도 강 상류에서 또는 하류에서 장사를 다니는 배들이었을 것이다. 아직 상고(商賈: 규모를 갖춘 장사꾼)라 부르기에는 영세한 그들이었다. 분포나루는 제법 중요한 나루였다. 세종께서 대마도 정벌을 떠나는 이종무 장군들을 격려한 곳도 이곳 동호였다. 분포나루에는 객줏집도 있었다. 배가 머무는 나루에 어찌 한 잔 없을쏘냐? 후세에 이곳 주모 이야기도 남아 있다. 곰보에 들창코 주모가 이곳에 있었다고 한다. 장사가 잘되었다. 주모가 매력 있어서가 아니었다. 외상 술을 잘 주는데 까막눈이다 보니 장부가 없었다. 기억력도 나빠 외상이 쌓여도 재촉할 줄을 몰랐다 한다. 그래도 손님이 많다 보니 항상 바빴다.
매월당도 어느 객주에서 한 잔 한 것일까?
돌아오는 돛배
江 어구 서늘해지며 바로 저녁놀이구나
부들 돛 단 배들 모두 바람 가득 가볍네
고향에 돌아갈 땐 배꽃 이미 피었겠지
봄날 용수에 새벽 술 괴는 소리 작게 들리네
歸帆
江口涼生正晚霞。蒲帆个个飽風輕。故鄕歸去梨花趁。一簀春酤細有聲。
문득 지훈과 목월의 시구가 생각난다. “술 익는 강마을의 저녁노을이여”.
綿布가 넉넉지 않아 그랬는지 돛(帆)은 黃布(황포)돛대라 쓰지 않고 부들돛대(蒲帆)라 썼다. 규모가 작은 배들은 아마도 부들이나 창포 또는 갈대를 발처럼 엮어 돛으로 썼던 모양이다.


또한 강을 끼고 사는 강마을 사람들은 용왕(龍王)님을 비롯한 신(神)들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야 했다. 한강가 강마을에는 마을마다 이분들을 모신 당집(부군당: 府君堂)이 있었다. 지금도 많이 남아 있다. 당산동의 당집, 창전동에 공민왕 당집, 동빙고 서빙고 부군당, 보광동 김유신 장군 모신 당집, 한남동 큰 당집, 작은 당집….

강마을은 없어지고 이제는 강으로 접근도 어렵다. 당목(堂木)은 고사(枯死)하고 부군당들은 개발로 무너져 가고 있다. 우리 시대에 더 이상 용왕님께, 부군 할머니, 부군 할아버지께 빌 일도 없다. 그러나 이런 것들 다 버리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배 한 척, 마을 한 곳 없는 한강가를 바라보니 철새만 가득하구나.
- 관련태그
- 매월당 김시습 이한성 싯길 한시










 제767호
제76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