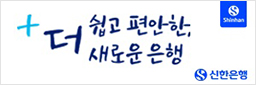“사람이 하나의 직업으로만 살라는 법이 있느냐.”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에서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의 공보특보로 최근 임명된 허용범 특보가 언론을 향해 남긴 말이다. “경선 후에 캠프에 참여하면 너무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서 지금 합류하기로 했다.” 이 말은 지난 9일 역시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 캠프로 자리를 옮긴 진성호 전 조선일보 인터넷 뉴스부장이 자신을 향해 질문을 던진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비단 허 특보와 진 부장 외에도 각 언론사마다 유력 대선 주자 캠프로 ‘직업’을 옮긴 언론인들은 많다. 특히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들의 당선 전망이 현실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이명박·박근혜 등 이른바 ‘빅2’ 진영을 향한 언론인들의 ‘쏠림 현상’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현직 언론인들이 이직이나 휴직 기간도 없이 취재현장에서 곧바로 대선후보들의 캠프로 가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9일 이명박 캠프로 ‘이직’한 진성호 부장 같은 경우는 정치부 기자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그는 20년 동안 조선일보에 근무해왔지만, 그간 문화부 기자와 미디어팀장, 그리고 인터넷뉴스부장을 역임했었다. 진 부장은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과 이른바 ‘친노 인사’들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으로 유명세를 치렀다. 청와대의 대표적인 ‘안티 조선 인사’인 양정철 비서관과는 일대일로 ‘맞짱 토론’을 벌일 만큼의 ‘뚝심’을 보이기도 했다. 진 부장은 2년 전인 2005년에는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가 노 대통령의 후계자(대선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당시로서는 다소 ‘과격한’ 예측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고, ‘내가 노무현 대통령이라면’이라는 글로 ‘친노 그룹’의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다. 그런 그가 이명박 전 시장 측으로 간 것을 두고,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요즘 “파견이냐, 차출이냐”는 우스갯소리가 돌기도 했다. “대선 정국 이후에 진 기자가 조선일보로 복귀하면 파견이고, 계속 남아 있으면 차출”이라는 소리다. ■ 정치를 하려면 기자부터 돼라(?) 진성호 부장과 허용범 특보 외에도 ‘빅2’ 캠프로 옮겨간 언론인들은 ‘너무나’ 많다. 먼저 이명박 전 서울시장 캠프를 들여다보면, 동아일보 정치부장과 논설위원을 지낸 이동관 씨도 지난 6일 이명박 후보의 공보실장에 임명됐다. 이에 대해 이명박 캠프의 기획본부장인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이 실장은 현역 시절 정치부 기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직관력을 보여준 사람”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또 동아일보 논설주간 출신의 최규철 씨는 이명박 캠프의 언론위원장을 꿰차고 있고, 한국일보 정치부장 출신인 신재민 씨는 메세지 단장을,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 출신인 강승규 씨는 홍보단장을, KBS 창원총국장 출신인 양휘부 씨는 TV 토론 대책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들 외에도, 한국일보 편집인 출신의 이성준 씨와 서울신문 편집국장을 역임한 김영만 씨, 경향신문 정치부장 출신인 김해진 씨,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맡았던 김효재 씨, 연합뉴스 편집국장이었던 서옥식 씨, 동아일보 논설위원 출신의 염연철 씨, 경향신문 논설위원이었던 임은순 씨, SBS 국제부장 출신의 임군기 씨, 한국일보 논설위원이었던 조명구 씨, 조선일보 사회부장 출신인 함영준 씨 등 이명박 캠프의 언론인 출신들의 면면은 그야말로 ‘초호화 군단’이다. 박근혜 전 대표 캠프도 만만치 않다. 조선일보 워싱턴특파원을 3년 간이나 역임한 허용범 특보가 먼저 눈에 띈다. 조선일보 부사장 출신의 안병훈 씨도 박근혜 캠프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조선일보 부국장과 KBS 이사를 지낸 이영덕 씨가 커뮤니케이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고, 동아일보 부국장을 지낸 바 있는 황재홍 씨와 SBS 보도본부장 출신의 송석형 씨, MBC 정치부장 출신의 김용철 씨 등이 부위원장을 맡는 등 이명박 캠프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는 진용을 갖추고 있다. 전 iTV사장인 표철수 씨, SBS 정치부장 출신의 허원제 씨,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이상현 씨 등도 각각 박근혜 캠프의 TV토론대책단장과 방송단장, 신문단장을 맡고 있다. 현역 언론인으로는 김행 시사저널 편집위원이 지난달 20일 박근혜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의 이른바 ‘빅2’ 진영이 호화 멤버로 구성돼 있는데 반해, 범여권 대선 주자들의 경우는 전현직 언론인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편이다. 이를 두고, “정치를 하려면 기자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범여권 대선 주자들 중 그나마 사정이 나은 쪽은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캠프 정도다. 손 전 지사 캠프에는 문화일보 논설위원 출신의 김재목 씨와 KBS 라디오제작팀장 출신의 배종호 씨가 합류해 있다. ■ 직업 선택의 자유는 있다지만… 그러나 언론인들이 정치인 또는 정치인의 참모로 변신하는 것에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 “심판이 갑자기 호루라기를 집어던지고 선수로 뛰려고 한다”는 비난도 들린다. 물론 전현직 기자들의 대선 캠프 합류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그때마다 논란이 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기자의 언론관을 문제시하는 지적도 있어왔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는 반론도 있다. 박근혜 캠프의 허용범 특보 역시 “사람이 하나의 직업으로만 살라는 법이 있느냐. 정치인이든 공무원이든 모든 직업이 개방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자들이 정치권으로 가는 것도 백안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교수를 하다가 정치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있다. ‘폴리페서(politics+professor)’라는 합성어다. ‘폴리테이너(politics+entertainer)’라는 말도 있다. 연예 활동을 하다 정치에 입문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합성어다. 그러나 이제는 ‘폴리널리스트(politics+journalist)’라는 말까지 나온다. 현직 언론인들이 이명박·박근혜 캠프로 너도나도 몰리는 현상을 비꼬는 용어다. 사실 언론인들의 정치 입문은 그 자체로는 문제시 될 수 없는 사안이기는 하다. 이미 우리 정치권에는 언론인 출신이 너무나도 많다. 한나라당에는 고흥길, 심재철, 박성범, 이윤성, 맹형규, 이계진, 전여옥, 최구식 의원 등의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범여권에도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과 정동영 전 우리당 의장, 김한길 통합민주당 공동대표 등이 대표적인 언론인 출신 정치인으로 자리매김돼 있다. 요즘 언론계에서 떠도는 유행성 한탄 중 하나가, “정치부 기자가 씨가 말랐다”는 말이다. 대선 출마를 선언했거나, 선언을 준비 중인 각 주자 진영에서 ‘쓸만한’ 정치부 기자를 ‘싹쓸이’ 하다시피 하면서 나온 말이다. 그렇지 않아도 제대로 된 기자가 부족한 한국 언론의 현실에서, 그나마 능력 있는 기자들은 차출인지 파견인지 모를 형태로 각 대선 주자 진영을 기웃거리고 있다. 정치 관련 기사의 신뢰가 갈수록 떨어지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유성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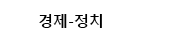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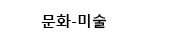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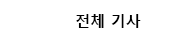







 제26호
제2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