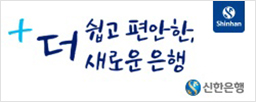▲프라하성에서 본 ‘100탑의 도시’ 프라하 전경. 19세기 초 탑의 개수를 세어보니 100개에 달했는데 지금은 500개가 넘는다고 한다. 개인들의 탑까지 합하면 1000개가 넘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사진 = 김현주 ▲찰스 다리의 장식물. 고풍스러운 모습이 눈길을 끈다. 찰스 다리의 양쪽 끝엔 고딕 타워가 있고 다리 양쪽 난간에 줄지어 서 있는 성자상은 모두 체코 최고 조각가들이 제작했다. 사진 = 김현주 ▲볼타바 강변 선착장에서 막 출발하려는 유람선을 탔다. 한 시간 운항에 220크로네(약 1만 6000원)로 싸지 않았지만, 선상에서 맥주를 즐기며 프라하성과 성비투스 성당, 카프카 박물관 등을 감상할 수 있었다. 사진 = 김현주 ▲국립극장 다음으로 유명한 신 르네상스 건축물 루돌피늄은 19세기 체코 건축물 중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꼽힌다. 1946년부터 체코 필하모니 공연장으로 사용됐다. 사진은 루돌피늄 앞에 서 있는 드보르작 동상. 사진 = 김현주 ▲오랜 역사를 간직한 유대인 지구. 담장 너머 유대인 묘지가 세월의 풍상을 말해준다. 기독교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립과 멸시 속 1000년 가까이 게토에 갇혀 지내다가 1850년 요셉 황제가 이주의 자유를 줬다고 한다. 사진 = 김현주 ▲볼타바강에 걸린 많은 다리 중 가장 아름답다는 찰스 다리는 늘 전 세계 관광객들로 붐빈다. 특히 연인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돈조반니 인형극으로 유명한 국립 마리오네트 인형극장. 돈조반니 인형극은 체코 국내 공연만 5000회가 넘고, 해외 공연도 많이 이뤄진다. 사진 = 김현주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10일차 (부다페스트 → 슬로바키아 횡단 → 프라하)
슬로바키아 통과
새벽길을 서둘러 버스 터미널에 나가 6시 30분에 출발하는 프라하행 유로라인즈 버스에 오른다. 출발 2시간 40분 만에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슬라바에 도착했다. 꾸물거리는 날씨만큼 우중충한 공업 도시다. 부다페스트를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나라 하나 건너오니 사회주의식 고층 아파트들로 가득 찬 멋없는 도시가 나타난 것이다.
1993년 체코에서 평화적으로 분리, 독립한 슬로바키아는 남한 면적 절반에 인구 550만 명, 1인당 소득은 1만 5700달러로, 슬로바키아어를 사용하고 있다. 수많은 중소 국가들로 갈라져 있는 유럽의 복잡한 지도만큼 유럽 근현대사는 복잡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기아자동차와 삼성전자가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와 관련이 높은 나라다.
버스가 작은 도시 한두 군데 더 들른 뒤 다시 고속도로에 오르니 프라하 200km 표시판이 보인다. 바깥 날씨는 15℃이고 보슬비가 온다. 인구 1000만 명이 조금 넘는 체코는 남한보다 면적이 작고 1인당 GDP 1만 8500달러로 헝가리보다 아주 조금 낮지만 동유럽에서는 잘사는 나라에 속한다. 프라하 인구는 120만 명이다. 평지와 산악 비율이 7 대 3인 나라답게 부다페스트에서 프라하 가는 길은 언덕 하나 없이 드넓은 초원이다. 그러나 날씨가 선선해 농업으로는 먹고 살기 어려울 것 같다.
체코는 알파벳 문자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고유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 지명이나 고유명사의 뜻을 짐작하기 어렵다. 게다가 프라하는 오래된 도시이고 도로가 미로 구조로 돼 있어 길 찾기가 고역이다. 오늘 오후 나들이 나갔다가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중간에 몇 번씩 길을 묻거나 지도를 꺼내 돋보기를 쓰고 확인하는 성가심을 견뎌야 했다.
게다가 체코어는 세계에서 가장 발음하기 어렵다고 한다.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가 다 그랬듯이) 영어를 할 줄 알면 참 고맙겠는데 거리에서는 영어가 잘 통하지 않는다. 스스로 길을 찾아다니며 코스를 만들어가야 하는 솔로 여행자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슬라브인이 정착해 건설한 체코는 모라비아 왕국(9세기), 보헤미아 왕국(10~16세기), 합스부르크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1867~1918)의 통치를 받다가 1918년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으로 독립했다. 그러나 곧 이어진 나치 지배 6년, 공산 정권 44년은 이 나라의 근대화 기회를 앗아가 버렸다. 멋지게 생긴 사람들이 사는 나라이지만 역사는 암울했다.
호텔에 여장을 풀고 도시 탐험에 나선다. 이 도시의 콘셉트는 고딕 첨탑이다. 일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고딕 지구를 보고 강한 인상이 남았지만 이 도시는 전체가 고딕이다. 이번 여행 중 유럽을 동쪽에서 북서쪽으로 이동할수록 지붕과 탑의 기울기가 계속 가팔라지더니 여기서 절정을 이룬다. ‘100탑의 도시’인 것이다. 19세기 초 세어보니 100개에 달했는데 지금은 500개가 넘는다고 한다. 누구도 제대로 다 세어보지는 않았으나 개인들의 탑까지 합하면 1000개가 넘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호텔에서 조금 걸으니 곧 볼타바 강변이다.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강을 따라 고색창연한 건물들이 중세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저마다 다른 모습의 다리, 유람선, 수많은 조각상, 그리고 어디서나 우뚝 솟아 보이는 프라하성을 바라보며 남서쪽으로 걷는다. 여태까지 유럽의 유명한 도시들을 제법 다녀봤지만 프라하는 그 모든 다른 도시들을 압도한다. 풍광도 풍광이지만 환상적인 여름 날씨와 소박하고 인심좋은 사람들까지 보태어 종합적으로 그렇다는 뜻이다.
강변 선착장에 이르러 마침 출발을 기다리는 유람선을 만나 얼른 승선한다. 한 시간 운항에 220크로네(약 1만 6000원), 싸지 않다. 멀리 프라하성과 성비투스 성당의 뾰족한 첨탑이 시시각각 멋진 모습으로 다가온다. 강 건너에는 카프카 박물관이 보인다. 선상에서 맥주를 마시며 모처럼 여유를 즐긴다. 배는 아쉽게도 찰스 다리를 지나자마자 되돌아온다.
강 건너편으로 프라하성이 보이고 체코 필하모니 공연장인 루돌피늄이 바로 옆에 있는 기막힌 장소에 인터콘티넨탈 호텔이 있다. 멋없는 사각형 건물이지만 위치 하나는 백만 불짜리다. 언젠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이 도시에 다시 와서 저 호텔에 하룻밤 머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이 짧은 한 시간 유람선 코스가 끝난다.
참 멋진 도시에 왔다. 로댕은 이 도시를 ‘북쪽의 로마’라고 불렀다. 9세기말 보헤미아 왕국의 수도가 된 이후 수많은 역사가 농축된 중후한 역사 도시다. 역사가 그랬던 만큼 고딕, 로마네스크, 르네상스 및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이 모두 다 있다.
선착장에서 강변을 따라 찰스 다리 방향으로 조금 더 걸으면 루돌피늄이 나온다. 국립극장 다음으로 유명한 신 르네상스 건축물로서, 19세기 체코 건축물 중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꼽힌다. 1946년부터 체코 필하모니 공연장으로 사용되는 곳으로 오늘 밤에도 공연이 열린다. 오늘 레퍼토리는 모차르트 소야곡, 비발디 사계, 드보르작의 프라하 왈츠, 비제의 카르멘 등이다. 루돌피늄 앞 광장에는 드보르작의 동상이 서 있다.
프라하는 이처럼 눈뿐만 아니라 귀도 즐겁게 해주는 도시다. 루돌피늄 이외에도 도시 곳곳 공연장 혹은 성당, 교회가 공연으로 분주하다. 찰스 다리 바로 앞 성프란시스 교회는 아베마리아 오르간 연주가 오늘 레퍼토리다.
발걸음을 옮겨 유대인 지구(Josefov, 요세포프)로 향하다. 도시 역사만큼 오랜 유대인 역사는 도시 곳곳에 많은 흔적을 뿌려 놓았다. 기독교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립과 멸시 속에 1000년 가까운 세월을 게토에 갇혀 지내다가 1850년 요셉 황제가 이주의 자유를 줬다고 한다. 이 거리 이름 요세포프는 바로 그 이름을 딴 것이다. 이제는 온전히 시내 중심 명품 거리가 됐지만 담장 너머 유대인 묘지가 세월의 풍상을 말해준다. 지구 내에는 신구 유대교회당(Old-New Synagogue)이 있다. 교당 앞면엔 1948년 이스라엘 독립전쟁 중 체코가 군사 훈련과 장비 지원을 해준 것을 감사하는 현판이 있다.
이제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찰스 다리로 끌린다. 볼타바강에 걸린 많은 다리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한다. 다리 양쪽 끝에는 고딕 타워가 있고 다리 양쪽 난간에 줄지어 서 있는 성자상은 모두 체코 최고 조각가들이 제작했다. 다리는 전 세계 관광객들로 붐빈다. 당연히 거리 미술가와 거리 연주자들도 한 몫을 한다.
강 건너 프라하성 모습이 한결 가까이 들어온다. 다리 위 관광객들 중 절반은 연인들로 보인다. 연인들이 사랑을 나누기에 이곳보다 나은 곳은 없어 보인다. 한국 관광객들도 많다. 여행 떠난 후 오랫동안 들을 수 없었던 한국어가 여기저기서 들리니 반갑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아예 도시를 휩쓸고 다닌다.
찰스 다리에서 올드타운 광장 가는 길에 우연히 돈조반니 인형극으로 유명한 국립 마리오네트 인형극장 앞을 지난다. 돈조반니 인형극은 체코 국내 공연만 5000회가 넘고 해외 공연도 많다. 극장 앞 게시판에는 한국 공연도 2회(2005, 2010) 했다는 내용이 당시 한국 신문 기사와 함께 게시돼 있다. 한국 젊은이들도 연이어 공연장으로 입장한다. 입장료는 600kc(한화 4만 2000원)으로 결코 싸지 않다.
좀 더 걸으니 드디어 유명한 올드타운 광장이다. 광장은 젊은이들로 가득하다.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화강암 바닥에 철퍽 주저앉아 사랑을 속삭인다. 참 건강미 넘치는 젊음이다. 이 광장은 체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다. 후스 종교전쟁, 30년 종교전쟁, 1945년 프라하 봉기, 그리고 1989년 벨벳 혁명이 모두 이곳에서 일어났다. 광장 주변으로는 오를로이 천문시계, 틴 성당, 니콜라스 성당이 둘러싸고 있다. 광장에서 복잡한 골목을 힘들게 찾아 나와 호텔로 돌아오다. 내일 여유롭게 돌아볼 것을 다짐한다.
(정리 = 김금영 기자)
- 관련태그
-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제440호
제4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