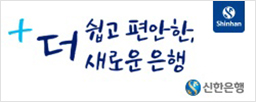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바르샤바를 뒤로 하고 파리로
인종 전시장 파리
파리에서 북동쪽으로 80km 떨어진 곳에 있는 보베 공항에서 버스(요금 15유로)로 파리에 입성했다. 파리는 인종 전시장이다. 흑인, 북아프리카인, 인도파키스탄인, 인도차이나계 아시아인 등 유색 인종이 백인보다 더 많아 보인다. 서울을 떠난 지 16일 만에 번잡한 대도시에 당도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낯선 대도시의 익명성 속에 존재감을 묻어버리는 것도 해외여행의 재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상한 외형의 퐁피두센터
복잡한 파리 지하철에 익숙해지기 위한 신고식인 양 목적지 반대 방향으로 한두 정거장 가다가 되돌아오는 실수를 한다. 자유분방한 도시 분위기와 시민의 삶이 그대로 전해 온다. 파리의 박물관들은 주로 화요일에 휴관한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은 파리 3대 미술관(오르세이, 루브르, 퐁피두센터) 중에서 문을 연 두 곳, 퐁피두센터와 루브르에 먼저 들르기로 한다.

▲생각보다 훨씬 거대한 에펠탑의 크기에 놀랐다. 321m 높이로 파리의 상징으로 꼽히며 항상 관람객이 북적댄다. 사진 = 김현주

▲퐁피두센터의 외관. 파리 시내 한 복판에 있는 이 건물은 하수관과 배수관이 마구 겉으로 드러나, 마치 짓다만 건물 같은 독특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사진 = 김현주

▲퐁피두센터에서 보이는 파리 전경. 독특하고 아름다운 건물이 가득해 눈길을 끈다. 사진 = 김현주
세느(Seine)강은 수백 년을 거쳐 파리의 해자, 상수원, 하수도, 욕조, 그리고 근래 들어서는 고속도로 역할까지 해왔다. 강은 도시를 좌우제방으로 가르며 왼쪽은 보헤미안, 오른쪽은 귀족 지역으로 구분했다. 프라하처럼 화려한 멋을 부리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가진 프랑스라는 나라에 대한 기존 이미지와 어우러져 멋지기만 한 것은 나만의 느낌일까?

▲파리의 대동맥인 세느강의 작은 백사장에 일광욕을 즐기는 시민들이 가득하다. 10톤 트럭 550대 분량의 모래를 쏟아 부어 2002년 만든 인공 백사장이다. 사진 = 김현주
루브르 박물관과 외규장각 도서
걷다가 지하철로 바꿔 타 루브르 박물관에 내린다. 르네상스와 로코코 예술품이 가득한 곳이다. 오늘도 박물관은 관람객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박물관 규모가 워낙 커서 부대낄 정도는 아니다. 왁자지껄한 것이 말해 주듯, 동양인 단체는 대부분 중국인이다. 지금 파리는 중국인이 싹쓸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래도 중국인이 파리를 보고 가면 뭔가 깨닫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진정한 대국으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돈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이 자신들에게는 아직 없다는 깨달음 말이다.

▲노트르담 성당은 1163년에 기공해 182년 걸려 완성된, 800년 묶은 건물이다. 아름답고 고풍스런 외관이 특징이다. 사진 = 김현주
콩코드 광장에서 개선문까지
루브르에서 콩코드 광장으로 나가려면 튈르리 정원을 지난다. 화려한 정원 분수에서 시민들이 태양을 즐긴다. 그리고는 카루셀의 개선문이다. 나폴레옹의 수많은 전쟁 승리를 기념해 1808년 완성했다. 개선문 위 네 마리 조각상이 어설프다. 베네치아 산마르코 성당에서 빼앗아 온 것을, 1815년 나폴레옹의 워털루 전쟁 패배로 돌려준 뒤 다시 제작해 올린 것이다. 19세기 영국과 프랑스 두 열강의 제국주의 경쟁이 별별 해프닝을 다 만들어 내고 있었다.

▲루브르 광장. 르네상스와 로코코 예술품이 가득한 루브르 박물관엔 전 세계의 관람객이 모여든다. 프랑스 전체를 내주어도 루브르는 내줄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사진 = 김현주

▲콩코드 광장을 배경으로 카루세르이 개선문이 서 있다. 나폴레옹의 수많은 전쟁 승리를 기념해 1808년 완성된 개선문 위 네 마리 조각상이 눈길을 끈다. 사진 = 김현주

▲파리의 개선문. 나폴레옹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공사를 시작했으나 정작 나폴레옹은 완공을 보지 못하고 사망했다. 로마 콜로세움 옆 개선문에서 콘셉트를 잡았다고 한다. 사진 = 김현주
개선문에서 6호선 메트로를 타고 몇 정거장 지난 비르하켕 역에 내리니 에펠탑이 멀지 않다. 에펠탑은 프랑스혁명 100주년인 1889년 열린 만국박람회를 기념해 에펠이 세운 321m 높이의 파리 상징이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큰, 어마어마한 규모의 탑을 올라가기 위해 끝없이 긴 줄이 늘어서 있다. 게다가 단체 관람이나 예약 관람만 가능하니 나는 자연스럽게 탈락해 대신 바로 근처 강가에서 출발하는 유람선에 탑승해 멀리서 에펠탑을 조망하기로 했다(유람선 한 시간 코스에 12유로).

▲물랑루즈의 빨간 풍차가 도는 풍경. 프렌치 캉캉의 발상지로서, 유흥가라는 느낌은 별로 주지 않는다. 니콜 키드먼과 이완 맥그리거 주연의 영화로도 유명한 현장이다. 사진 = 김현주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메트로 2호선 블랑쉬역에 잠시 내렸다. 물랑루즈의 빨간 풍차가 돌고 있는 야릇한 풍경이다. 프렌치 캉캉의 발상지로서, 화가 로트레크의 그림이 생각난다. 이 주변은 카바레(무도회장) 타운이지만 유흥가라는 느낌은 별로 주지 않는다. 많은 관광객이 빨간 풍차에 반해 발걸음을 떼지 못한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작은 무도회장이지만 로트레크의 그림이 있고, 니콜 키드먼과 이완 맥그리거 주연의 영화가 있기에 이곳에 일부러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다. 역시 결론은 ‘스토리텔링’이다.
(정리 = 김금영 기자)
- 관련태그
-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제446호
제44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