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NB저널 = 김집사 인문예술공유지 문래당(文來堂) 운영자, 생존인문 팟캐스트 ‘너도 고(古)양이로소이다’ 진행자)
(CNB저널 = 김집사 인문예술공유지 문래당(文來堂) 운영자, 생존인문 팟캐스트 ‘너도 고(古)양이로소이다’ 진행자)사탄의 맷돌과 블루스의 윤리
18세기 말∼19세기 초에 활동했던, 영국의 시인 겸 화가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자신의 서사시 ‘밀턴’에서 산업혁명으로 혼란에 빠져버린 19세기 초의 영국 현실을 ‘음침한 사탄의 맷돌’이라고 표현했다. 그 이후 ‘사탄의 맷돌’은 자본주의에 대한 대중의 공포를 상징하는 문학적 메타포(은유)가 됐다.
한편, 블루스는 글자 그대로 곧 슬픈 것(blue)의 복수형, 즉 혼자가 아닌 ‘복수로 슬픈 것’을 의미한다. 이는 원래 아메리카 흑인 노예들이 고향에서 강제로 미 대륙에 끌려와 울부짖던 ‘들판에서의 절규(field-holler)’로부터 연원한다.
음악 평론가 강헌은 “노동의 고통과 자유에의 갈망과 좌절은 재즈로 진화하는 음악적 자양분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마이 야마네가 작곡한 ‘카우보이 비밥’의 배경음악에 ‘Blue’라는 곡이 있다. 그 곡 안에 등장하는 "No black and white in the blue(푸른색/우울-슬픔 안에는 검정색/흑인도, 흰색/백인도 없다)”는 아포리즘(격언)처럼, 블루(스)의 세계는 선악의 이원론을 넘어선, ‘도덕의 저편’이기도 하다. 그래서 윤리적이다.

▲치달, '사탄의 맷돌'. 2016년 9월. 문래당.
예술과 책임, 단독적 삶과 총체적 문화
20세기 러시아의 문학평론가 미하일 바흐친은 ‘예술과 책임’이라는 논문에서, “지금의 예술은 너무 뻔뻔스럽고 자만에 빠져 있으며, 너무나 감상적이고, 당연히 그런 예술을 따라잡을 수 없는 삶에 대해 눈곱만큼도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 말은 곧 ‘인간은 예술 속에 있을 때는 삶 속에 있지 않고, 삶 속에 있을 때에는 예술 속에 있지 않다. 그것들 사이에는 어떠한 통일성도 찾아볼 수 없으며, 내적으로 서로에게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기에 바흐친은 더욱 “인간 문화의 두 영역인 예술과 삶은 통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삶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창조하는 것이 더 쉽고, 예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쉽다. 예술과 삶은 하나가 아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 안에서, 자신의 책임 안에서 하나가 돼야 한다.
우리의 세상은 반복될 수 없이 직접 단독적으로 경험하는 ‘삶’의 세계와 그런 유일한 세계들을 객관화 하고 통일성을 찾아 얻을 수 있는 ‘문화’의 세계 간의 반목과 갈등으로 점철돼 있다.
게다가 우리가 놓인 자본주의적 환경의 삶은 무엇이든 대체교환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이상 ‘삶’이 아니며, 자본주의적 문화는 통일성, 총체성으로서의 전망 능력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문화’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대 철학의 목표는 이 양자 간의 반목과 갈등을 자본주의의 안팎에서 극복하는 것이다. 자본을 넘어선 새로운 관계의 기반 위에서 대체 불가능한 단독적 삶과 총체적, 보편적 문화의 통일을 구현해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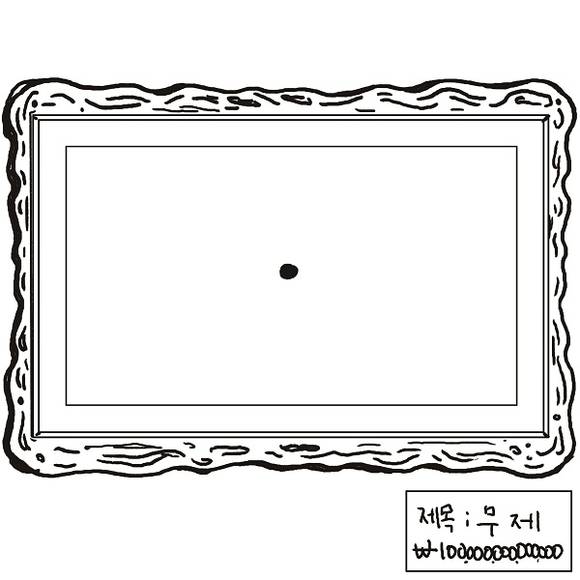
▲치달, '무제(無題)'. 2016년 9월. 문래당.
사람이 인(仁)하지 않고서야 음악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러나 삶과 문화(예술)가 일치할 수 있을까? 미학과 윤리가 합일할 수 있을까? 작가 고종석은 “뛰어난 글솜씨 또는 예술적 역량과 명민함은 인격적 성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고, 그 이전에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인간이 어떻게 사는가’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너무나 다르다”라고 통찰했다.
문학과 예술은 더 이상 인격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삶의 존재론적 영역은 이념과 당위의 윤리적 영역과는 완전히 별개의 세계이다. 이 익숙한 세계는 각 영역이 분과된 근대 이전의 감각이다.
반면, 비트겐슈타인은 버트런트 러셀에게 보낸 편지에서 “제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서 어떻게 훌륭한 논리학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고, 공자는 제자들에게 “사람이 인(仁)하지 않고서 음악이 무슨 소용이겠는가?(人而不仁, 如樂何?)”라고 반문했다. 논리학(학문)은 인격과 일체로 연계되어 있으며, 음악(예술)은 윤리와 일체로 연계되어 있다. 각 영역이 분과된 근대 이후의 감각이다.
우리를 규정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이다. 좋은 사람이 훌륭한 논리학자가 될 수 있고 인(仁)한 사람이 음악을 향유할 수 있다는 사고는, 빛바랜 중세의 세계감각이면서도 근대 이후에 다시 도래했던 감각이다. ‘오래된 미래’다. 삶과 예술, 미학과 윤리는 자본의 시대에 병존할 수 있을까? 돈, 권력, 섹스인가? 이상, 이념, 예술인가? 삶, 윤리, 실천인가?
차이의 페티시즘 vs 공통적인 것(The Common)
60년대 전공투 세대의 이념과 사랑, 권력의 문제를 성찰한 카와구치 카이지의 작품 ‘메두사’에 등장하는 자민당 거물 정치가의 딸이자 전공투 리더 요오코는 돈과 폭력, 술과 섹스로 가득한 신주쿠 거리에서 몸을 팔며 “사람은 이상이나 이념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 거리가 불타오르던 것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
*전공투: 전국학생공동투쟁회의의 약자. 1960년대 일본 학생운동 시기에 각 대학교에 결성된 주요 각 파의 전학련이나 학생이 공동투쟁한 조직이나 운동체.
20세기 영국의 문학평론가 테리 이글턴은 1960년대와 19세기의 세기말을 “정치적 급진주의와 문화적(예술적) 급진주의가 놀랄 만큼 뒤섞인 시기”로 분석했다. 서구의 1960년대가 끝나갈 무렵의 사회 전체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 정치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이 깊이 연계되어 있는, 즉 문화가 개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이 두 가지 길로 동시에 뻗어 있는 언어였던 시절은 과연 다시 올 수 있을까?
좌파의 정치적 좌절 이후 문화가 정치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우리를 연계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모두 다 동일한 사람으로 환원하는 전체주의적인 것으로 지탄받았다. ‘차이’만이 소중하다는 구호, 곧 차이의 페티시즘이다. 다양성을 강조했던 포스트모던은 이미지와 현실, 진리와 가상, 역사와 픽션, 특히 윤리와 미학이라는 구분을 지워버린 것이다.
그러나 근대 미학을 이론적으로 정립시킨 칸트는 “타자를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동시에 목적으로도 대하라’고 했고, 팔백만신(八百万神)의 다신교 사회 일본에서 독실한 기독교 사상가였던 니토베 이나조는 요한복음을 재해석해 “이 세상에 있으되 이 세상의 존재가 되지 말라”고 했다.
미학(예술)과 함께 목적으로서의 자유, 진리와 윤리, 종교와 이념 등의 보편적인 담론은 여전히 중요하며, 우리는 여전히 ‘자기를 넘어서는 것’에 접속하고 싶어 하고, 우리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 곳’에 존재하려 한다.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게 하는 ‘사탄의 맷돌’에 갈려 모래알처럼 분산될 것인가? 각각의 다름을 존중하면서도 ‘공통적인 것’으로 연대할 것인가?
- 관련태그
-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제502호
제50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