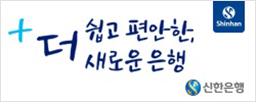미국의 주택시장 불황으로 시작됐던 전 세계적 경기불황이 어느덧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국내외 모든 지표와 기업들의 실적 등을 살펴보면, 세계 경제를 2006년 이전의 호황으로 되돌리는 것은 아직 요원할지라도 최소한 한국경제는 디폴트 위기, 외환고갈론 등 각종 루머가 판을 쳤던 2007년과 2008년에 비하면 확실히 나아지고 있다. 비록 이명박 대통령이 아직 경기회복에 따른 출구전략 수립을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지만, 이 같은 논의가 정부·정치권·재계에서 진행되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의 회복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이로써 노동권 후퇴, 재벌 봐주기 등 여러 가지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2기 경제팀이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양극화 갈수록 심화 이달 초 상장사협의회에서 발표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들 중 12월 결산법인 617개 종목들의 2009년 상반기(2009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적을 점유율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각 업종마다 상위 3~5개사가 시장점유율 및 이익점유율 등 모든 면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이 같은 행보가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건설사 중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한 곳은 현대건설·GS건설·대우건설·대림건설 등 4곳. 매출점유율·영업이익점유율·반기순이익점유율 모든 곳에서 1위부터 4위까지 위 4곳 외의 다른 건설사들이 끼어들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빅4의 실적들은 나머지 33개 상장 건설사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월등했다. 올해 상반기 빅4 건설사들의 매출 실적 1위 기업은 현대건설이다. 동사는 4조6402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37개 상장 건설사 총 매출액의 16.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3조8694억 원의 매출을 올린 GS건설은 13.5%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그리고 3조332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상장 건설사 매출점유율 11.6%를 차지한 대우건설이 3위를 차지했고, 2조818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상장 건설사 매출점유율 9.8%를 차지한 대림이 4위를 차지했다. 이들의 매출실적을 모두 합치면 14조6603억 원으로, 37개 건설사 전체 매출액 28조7335억 원의 51.0%에 해당된다. 즉 금호산업·동부건설·현대산업개발·두산건설·경남기업·벽산건설·코오롱건설 등 쟁쟁한 재벌그룹 계열의 대건설사들과 풍림산업·삼부토건·삼환기업·고려개발·성원건설 등 중소형 건설사들의 매출 실적을 모두 합쳐도 빅4 건설사 실적보다 적다는 계산이 나온다. 건설사 매출 1위 현대, 이익 1는 GS 이 같은 차이는 이익점유율, 즉 영업이익 점유율에서 더 벌어진다.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37개의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낸 곳은 현대건설이 아닌 GS건설이다. 동사는 2773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둬들여 37개 건설사 영업이익 총합에서 17.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2위 업체는 빅4 건설사 중 매출실적 꼴등을 차지한 대림산업. 대림산업은 매출 부문에서 빅4 건설사 중 4위에 머무른 반면, 영업이익은 2450억 원을 기록해 GS건설에 이어 당당히 2위를 차지했다. 대림의 영업이익점유율은 15.3%. 그 뒤로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의 현대건설이 2312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해 14.4%의 이익점유율을 기록했으며, 대우건설이 104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6.5%의 이익점유율을 달성했다. 결국 GS건설·대림건설·현대건설·대우건설 등 대형4사의 매출점유율은 8579억원으로, 전체 37개 상장 건설사의 영업이익 총합 1조6065억 원의 53.5%에 달했다. 이는 빅4업체와 하위 33개 사 간의 점유율 격차가 매출액 부분에서는 2% 포인트이던 것이 영업이익 부문에서는 7%로 확대된 것이다. 그런데 빅4종목들의 매출실적과 영업이익 실적을 비교해 본결과, 4개 사의 분야별 위상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상반기 37개 상장사 중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매출실적을 기록한 현대건설이 영업이익 실적에서는 3위로 말려났다. 반면, 빅4 중 시장점유율 꼴찌에 머물렀던 대림산업은 영업이익 실적에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을 제치고 2위로 뛰어올랐다. 이는 원가비율의 차이 때문이다. 실제로 4개 사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을 살펴본 결과, 대림산업이 8.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GS건설이 7.2%, 현대건설이 5.0%, 대우건설이 3.1% 순이었다. 이는 상반기 건설시장에서 수주능력 즉 영향력은 현대건설이 단연 최고지만, 수주된 공사물량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능력에서는 대림건설과 GS건설이 가장 뛰어났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매출점유율 즉 시장점유율은 업계에서 그 회사의 위상과 영향력 즉 몸집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활용되는 반면, 영업이익을 기초로 만든 이익점유율은 그 회사의 사업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측정할 때 쓰인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현대건설과 GS건설을 리딩 기업으로 손꼽고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은 그보다는 대림산업과 GS건설에 더 많은 투자금을 배정한다. 일반적으로 매출점유율과 이익점유율은 대체로 비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신규 시장 진출 및 고객 확보 등 경영적 판단 차원에서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공격적 마케팅을 실시하거나 자본력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지만, 기술력 등 제반 사업능력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과다 비용 등 사업구조가 아주 잘못된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시장점유율이 높아 보여도 이익점유율이 낮을 수 있다. 휴대폰 사업 부문의 세계 시장점유율 추이가 대표적인 예다. 7월 22일 독일의 유력 언론 매체인 도이치뱅크의 발표에 따르면, 노키아·삼성전자·LG전자·소니·모토롤라·에릭슨·애플·림 등 글로벌 휴대전화 제조업체 8곳에 대한 점유율 조사 결과, LG전자는 시장점유율 3%에 이익점유율 5%를 기록했다. 반면, 애플은 세계 휴대폰 시장 점유율이 1%에 불과하지만, 영업이익 점유율이 20%에 달하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이 경우 세계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애플보다 LG전자를 더 많이 의식할 수 있지만, 세계 투자금은 LG전자보다는 애플에 더 많이 몰리게 된다. 반기순이익 점유율 이익점유율을 영업이익이 아닌 반기순이익 즉 최종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빅4사들과 나머지 33개 회사들의 차이는 더 이상 메울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게 된다. 현대건설·대림건설·GS건설·대우건설의 반기순이익은 모두 7962억 원이다. 반면, 금호산업 이하 33개 기업들의 반기순이익 총합은 2258억 원에 불과하다. 결국 코스피 시장의 상장 건설사 빅4가 반기순이익 부문에서 78.0%를 점유했고, 나머지 22.0%를 33개 업체들이 나눠 가진 셈이다. 매출실적 부문에서는 빅4 건설사와 나머지 33개 상장종목 간의 격차가 2%에 불과했고, 영업이익 부문에서도 양자 간 차이가 7%밖에 벌어지지 않은데 비해, 최종 반기순이익 분야에서는 무려 3.5배에 해당되는 56% 포인트나 큰 차이를 보였다. 중소 건설종목 33개사의 영업이익과 반기순이익 간의 이 같은 격차의 원인은 영업 외 행위로 인한 비용 즉 금융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는 지난해 주택시장 미분양 파동 이후 한국의 건설업계가 시장붕괴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혹독한 시련을 겪은 상황을 반영한다. 당시 정부가 건설시장과 한국경제의 붕괴를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실제로 개입을 하여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지만, 한국경제 시스템 전체와 건설시장 전반을 바라보는 관점의 회생일 뿐, 개별 건설사들은 위기 상황에서 죽지 않기 위해 차입금 조달, 회사채 발행, 주식 매각, 정부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 확보에 혈안이 돼 있었다. 또한 코오롱건설 등 당시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건설시장 붕괴, 자금압박설 등의 루머로 인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기존에 있던 분양계약 취소, 투자금 회수 러시에 떠밀려 멀쩡했던 건설사들의 부실이 현실화되는 등 악순환이 이어졌었다. 이 과정에서 버티지 못한 상당수 건설사들은 퇴출·도산·워크아웃 등으로 사실상 시장에서 종적을 감췄다. 하지만 살아남은 현재의 건설사들도 생존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회사채·차입금·미지급금 등의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차입금과 회사채 상환금을 회사채 발행으로 막는 등 부채비중이 급증하여 결국 금융비용만 늘어나게 됐다. 이는 빅4 건설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사들이 재벌 계열사 여부, 대형사 여부를 막론하고 지난해 불어닥친 주택시장 미분양 파동과 금융사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강한 리스크 평가 등으로 인한 충격에서 아직 비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업계는 시장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제 떨쳐버렸다”며 “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살아내는 과정 속에서 얻게 된 기초체력의 약화를 포함한 부작용들을 떨치고 건강한 회사, 건전한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부터의 과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제133호
제133호 
![[IPO] ‘복합 환경시험 장비’ 이노테크, 공모가 상단 1만4700원 확정…기관 확약률 56%](/data/cache/public/photos/20251043/art_194052_1761291099_170x11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