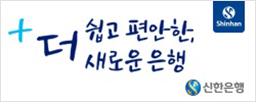아침에 신문을 펼치는 느낌은 한국과 외국에서 상당히 다르다. 미국 신문을 읽고 난 뒤의 감정 상태는 대개 중립적(neutral)이다. 경제 보고서 또는 과학 논문 등을 읽은 뒤의 기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한국 신문은 다르다. 읽는 사람의 감정을 출렁거리게 만든다. “아니, 이런!”이란 감탄사가 나오게 만드는 기사 내용이 그렇고, 감정을 일부러 잔뜩 얹은 제목도 그렇다. 이런 ‘독후감’은 인터넷도 마찬가지다. 기사 뒤에 달린 댓글을 보면 미국 매체의 경우 대개 코멘트인 경우가 많다. 기사가 제시한 측면과는 다른 측면을 제시하는 ‘정보 제공성’ 댓글이 많고, 이런 댓글을 읽으면 “아하, 이런 측면도 있구나”라고 감탄하게 된다. 반대로, 한국 인터넷의 댓글은 그야말로 감정의 대폭발이다. “이 따위” “답답하다” “기자 XX” 등으로 이어지는 댓글들은 다른 측면의 제시와는 아무 상관 없고 자기 감정 표출에 바쁘다. 감정을 분출하는 댓글이 절반 이상인 경우도 많아 댓글을 계속 읽기가 힘들 정도다. 신문과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이런 한국판 열정의 폭발을 보면서 ‘이렇게라도 감정을 터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을 생각하게 된다. 한국인이 이렇게 감정을 터뜨리는 데는 2가지 큰 요인이 있는 것 같다. 하나는 문명화·근대화를 경험한 시간대가 짧아 아직 ‘촌사람’ 감정구조를 가졌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회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지배층에 많기 때문 아니냐는 생각이다. 촌사람 감정이야 근대화·국제화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유럽인에게 몇백 년 걸린 물질적 근대화를 불과 수십년 만에 뚝딱 해치운 한국인이지만, 국민 대부분이 ‘근대적 심성’을 갖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 심성의 근대화에는 시간이 걸리고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푸는 데도 여러 난관이 있지만, 사람이 일부러 일으키는 소음과 그에 따른 흥분은 당장 줄일 수 있다. 요즘 한국을 발칵 뒤집어놓고 있는 세종시·4대강 문제를 보면 이런 생각은 더욱 커진다. 정권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발언권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신중하기만 해도 이런 소동의 대폭발은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진화심리학자는 사람을 포함하는 모든 동물의 기본 상태를 ‘무심함’이라고 표현했다. 옆 동물이 건드리지 않으면 소가 말 보듯 하는 것이 동물의 세계라는 것이다. 맹수가 새끼를 치열하게 지키다가도 일정 단계를 넘어서면 ‘쿨하게’ 돌아서는 게 바로 동물의 무심함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전철간에 마주 앉은 사람끼리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고, 출근길 직장인들이 말없이 제 갈 길만 가는 것도 무심한 상태다. 무심한 상태는 동물적 단계지만, 사실 가장 편한, 에너지 소모가 가장 적은 상태다. 저에너지 무심 모드는 그러나 ‘사태’가 발생하면 흥분 모드로 바뀐다. 흥분 모드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비정상 상태다. 그래서 흥분하면 소화도 안 된다. 흥분 모드가 너무 오래 계속되면 탈이 나 죽게 된다. 노자 도덕경 5장에는 ‘천지불인(天地不仁) 성인불인(聖人不仁)’이라는 말이 있다. 자연이나 성인은 인(仁)하지 않다는 것이며, 이때의 ‘仁’은 도올 김용옥의 해석에 따르면 ‘민감하다(sensitive)’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자연은 인하지 않기 때문에 때론 자비롭고 때론 잔인하지만 그게 자연이라는 가르침이다. 성인도 마찬가지로 잔정·잔재주에 휩쓸리지 않기 때문에 때로 잔인하고 때로 자비롭지만 세상이 순조롭게 돌아가는 데는 이런 성인의 무자비(無慈悲)가 제일 좋다는 것이다. 한국의 지배층만 정도를 걸으면서 스스로 센서티브해지지 않아 소동만 덜 일으켜도, 한국 사회는 지금보다 몇 배로 조용해질 수 있을 것이다. 지배층이 경거망동하지 않으면 민초들도 센서티브해지지 않는다. 국민들이 아프리카 초원의 동물처럼 무심하게, 먹은 게 체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제144호
제144호 
![[IPO] ‘복합 환경시험 장비’ 이노테크, 공모가 상단 1만4700원 확정…기관 확약률 56%](/data/cache/public/photos/20251043/art_194052_1761291099_170x11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