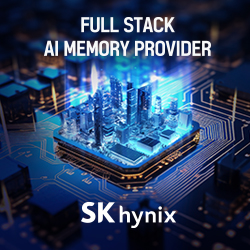[인터뷰] 김철우 작가는 왜 ‘멈춘다’ 했나? 길 위의 그림, 마지막 아니길…
갤러리 H ‘길 위에서 그리다! 그리고 멈추다’ 展, “4기 암, 장례식 대신 전시회”
 안용호⁄ 2023.07.18 20:17:38
안용호⁄ 2023.07.18 20:17:38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 50년. 길 위에서 만나는 풍경을 자신만의 감성으로 그려냈던 김철우 작가가 개인전을 열었다.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인사동 갤러리 H에서 열린 ‘길 위에서 그리다! 그리고 멈추다’ 전.
‘멈추다’라는 단어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지난 3월 말 4기 암 판정을 받았다. 김 작가는 절망 대신 전시회를 열기로 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장례라는 형식적인 추도 공간이 아니라 전시회라는 영원히 살아있는 공간에서 희로애락을 함께 한 가족, 친구, 제자들을 만났다.
인터뷰 약속을 해놓고 마음이 무거웠다. 암 판정 소식을 듣고 갤러리를 찾은 친구, 제자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애써 작가를 위로했다. 하지만 병마로 쇠약해진 얼굴로 손님들을 맞는 작가는 새 손님이 올 때마다 밝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맑고 초롱초롱한 눈빛의 그는 할 얘기가 많은 듯 보였다.
“아주 특별한 전시예요. 몸이 안 좋아 부제에 ‘멈추다’라는 단어를 넣어봤는데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아요. 그저 살고 싶다는 희망보다는 기회가 있다면 좀 더 자연스럽고 큰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요.”
마지막이 아니길 바라는 마지막 개인전
작가의 입에서 ‘희망’이라는 말이 나오자 비로소 긴장이 풀렸다. 산을 좋아해 즐겨 그리고 이와 대립하는 도시의 풍경도 함께 그렸던 수채화 작가. 그의 그림은 사실주의라기보다는 길 위에서 봤던 풍경의 느낌과 사랑스러움을 타인과 나누려는 소년의 낭만과 같다.

“고등학생 시절 설악산을 처음 보고 자연의 아름다운 조화에 마음이 크게 움직였어요. 산에 가면 마음이 편해요. 그 웅장함과 섬세함에 매료돼 해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설악을 그렸죠. 또 동으로는 울릉, 서로는 백령, 남으로는 제주 그리고 북으론 고성까지 사시사철 전국 각지를 다녔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상악화로 배편이 취소되어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며, 또 그 순간을 그림으로 남기려 했던 아날로그 시절…. 아직도 그때의 추억은 제 그림 속에 녹아 있습니다.”

산을 따라 걸어갔던 그의 미술 여행은 점점 넓고 광활해졌다. 베트남 하롱베이의 장관, 네팔 포카라에서 맞닥뜨린 마차푸차르의 진풍경. 작가는 거대한 네팔의 산봉우리를 너무 쉽게 감췄다가 살짝 보여주기를 반복하는 구름의 성스러움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아내와 함께한 해외 여행은 도시를 작가의 캔버스 안으로 들여놨다.
“파리에 가면 그곳의 냄새가 있고 분위기가 있어요. 일본에 가면 우동의 짭짤한 냄새가 지하철까지 배어있고요. 생활 속에 배어있는 도시의 냄새와 개성을 그림으로 전달하고 싶었죠. 특히 아내와 함께한 유럽 여행은 축복이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싼 와인과 바게트를 먹으며 허리띠를 졸라맸고, 싼 호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에어비앤비 숙소에 묵으며 정말 많은 곳을 재미있게 여행했습니다. 레드 와인보다 더 빨개진 볼을 주체하지 못한 채 멜랑꼴리해진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림은 작가의 감정을 타인과 나누는 작업
작가는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그림 안에 녹이고, 그 감정을 타인과 공감캐 하는 게 자신이 추구하는 작품 세계라고 말한다. 한여름 파리 센강에서 느꼈던 푸르른 여름, 노트르담 성당, 우중충한 구름 사이로 비가 개며 런던 건물 벽면에 드리워지던 따뜻한 햇볕. 작가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치 화폭 속에 여행을 다녀온 느낌이 드는 건 순간을 함께 나누려는 작가의 순수한 마음 때문이 아닐까.
작업의 깊이는 결코 크기와 재료, 장르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작가는 자신의 개성이 녹아있는 수채화를 그려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수채화는 가벼운 재질이잖아요. 저는 젊었을 때 저만의 진득함과 무게감을 표현하고 싶어 열 번 이상 덧칠을 했어요. 캔버스의 물성 자체를 바꾸는 거죠.”

아크릴과 유화같이 강렬한 색을 지니면서도 수채화의 은은함을 동시에 살려내는 그만의 유니크한 테크닉은 이렇게 탄생했다.
“요즘 젊은 후배들 참 열심히 해요. 한 가지 조언한다면 시류에 휩쓸리지 말라는 겁니다. 트렌드에 따라 모두 과일만 그리고 인형만 그리고 그래선 안 돼요. 사과를 그려도 내가 느끼는 사과를 그려야지. 자기 스타일을 만드는 것은 결국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후배가 함께 참여 한 이번 전시는 특히 아들 김휘열 씨가 직접 나서 준비했다. 호주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아들은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아버지의 전시 준비를 위해 휴가를 내고 귀국했다.
“가족과의 여행은 참 소중한 추억입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가족은 주말마다 산으로, 강으로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어요. 훗날 알게 되었지만, 아들 어릴 적 소원이 개근상을 타는 거였어요. 결국 아들은 그토록 원하던 개근상을 못 탔죠.”
작가에게 길 위의 그림은 결국 추억을 남기는 매개체가 아니었을까.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는 것이 즐겁다는 작가는 이번 개인전을 통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추억을 남겼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 관련태그
- 김철우 작가 갤러리H 북한산 포대능선 길위에서그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