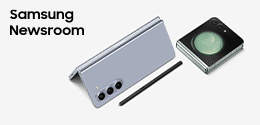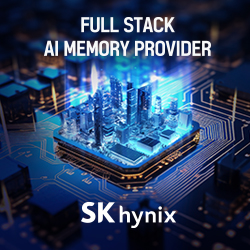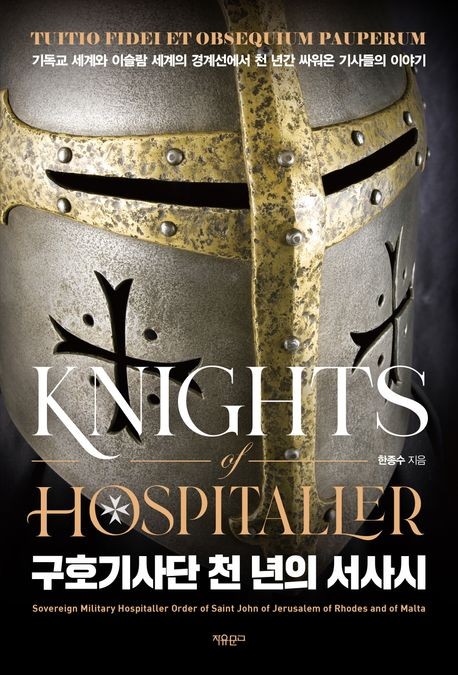
한종수 지음 / 자유문고 펴냄 / 592쪽 / 3만 3000원
1099년,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1차 십자군에는 종교기사단이라는 조직이 없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사와 군대가 유럽으로 돌아가고, 남아 있는 이들이 예루살렘 왕국을 비롯한 십자군 국가들을 세웠지만 그들의 숫자는 너무나 적었다. 왕국의 방어와 순례자들의 보호를 위해 ‘성전기사단’이 생겨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 요한 병원의 경비를 위해 ‘구호기사단’이 탄생했다.
이 두 기사단은 교황의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고, 예루살렘 왕국의 상비군으로 활약했다.
한편 십자군 세력은 너무 복잡하고 이해관계도 달라 숱한 내분을 겪어야 했고, 결국 1187년 이슬람의 영웅 살라딘에게 대참패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물론 대부분의 영토를 빼앗기고 만다.
이런 호된 시련을 겪었지만 십자군 세력은 단합하지도, 현지에 뿌리박는 데도 실패했고 결국 1291년 아크레가 함락되면서 성지에서 축출되고 만다. 구호기사단도 예외가 아니었지만 프랑스에서 멸망한 성전기사단과는 달리 로도스섬을 차지하면서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어엿한 주권국가로 자리잡는 성과도 거두었다.
두 세기가 넘는 장구한 활동 기간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기사들의 다양한 국적 역시 기사단의 명성을 더욱 드높였다. 구호기사단은 영지 경영, 이슬람 선박에 대한 습격, 해안 공격, 순례자에 대한 의료지원 등을 병행했고, 맘루크와 오스만의 대규모 공격도 저지하면서 두 세기가 넘는 세월을 버텨내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522년 술레이만 대제가 이끄는 십만 대군의 반 년 가까운 총공격을 견뎌내지 못하고 협상 끝에 명예로운 철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몰린다.
호된 방랑 기간을 보낸 구호기사단은 척박한 섬 몰타에 세 번째로 정착했고, 다시 오스만 제국에의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1522년, 분노한 술레이만이 보낸 대군을 맞아 넉 달 간의 혈전을 벌인 끝에 역사적인 승리를 가두어 전 유럽을 감동시키는 위업을 이루었다.
이후 기사단은 레판토 해전과 칸디아 공방전, 다르다넬즈 해전 등에서 계속 오스만 제국과 맞서 싸웠고, 많은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최초로 백내장과 요도결석 수술을 성공시키는 등 의학에도 공헌한다.
하지만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유럽 국가들의 관심이 대서양으로 옮겨졌기에 기사단은 변방을 지키는 존재로 전락하는 운명을 피할 수는 없었다.
프랑스 혁명으로 큰 재산 손실을 입은 기사단은 1798년, 이집트 원정 중인 나폴레옹에게 걸려들어 몰타를 내주고 이탈리아를 방랑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하지만 기사단은 박제화 되어 박물관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본연의 임무인 의료에다가 재해 구호 기능을 결합시켜 일종의 NGO 단체로 거듭났고, 여러 전쟁과 자연 재해 속에서 많은 부상병과 환자들을 구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작전명 발키리로 알려져 있는 히틀러 암살 작전에 비츨레벤 원수를 비롯한 많은 기사단원이 참가했다가 희생당하는 비극도 겪는다.
조직 구성-유지의 관점에서도 주목할 만
현재 구호기사단은 거의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110개국으로부터 정식 독립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구호기사단은 정식 기사만 치면 2,000명을 넘은 적이 없는 작은 조직이었지만, 십자군 전쟁은 물론 종교개혁, 로마 약탈, 영국 성공회 설립, 프랑스 혁명, 1, 2차 세계대전 등 유럽에서 일어난 굵직한 사건에 말려들어갔다.
그들이 상대한 적도 살라딘, 바이바르스, 티무르, 정복왕 메메드 2세, 술레이만 대제, 나폴레옹 등 세계사를 주름잡은 거물들이었다.
기사단의 발자취를 보면, 그들은 병원과 의료봉사부터 성지순례의 보디가드, 중장갑 기병, 요새 수비대, 산적과 해적, 해군, 무역상, 노예상, 예술 후원자, 행정기관, 토목 사업, 재해 구난 등 다양한 일들을 수행해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보여준, 국제적인 조직임에도 기본적으로 단결을 유지한 점, 말에서 내려 배를 타고, 칼과 창 같은 병기를 버리고 총과 포를 잡은 유연성, 의료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끝까지 유지한 일관성 등은 조직의 관점에서도 배울 점이 많다.
구호기사단의 이야기는 시오노 나나미나 로저 크롤리 등 여러 작가들에 의해 소개되어 있지만 모두 특정 시대만을 다루고 있을 뿐이어서, 우리나라에서 통사(通史)나 전사(全史)로는 이 책이 처음이라고 하겠다. 더구나 번역도 아니고 국내 작가의 노력으로 나온 작품이기에 더욱 의의가 있다.
- 관련태그
- 기사단 십자군 기독교 이슬람 오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