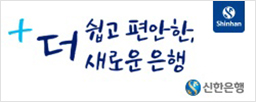[김맹녕 골프 칼럼]양띠해 라운드를 양과 함께
양이 잔디 깎는 ‘히말라야 골프클럽’의 절경에서
 제412-413호 김맹녕 골프여행사진작가협회 회장⁄ 2015.01.15 08:58:16
제412-413호 김맹녕 골프여행사진작가협회 회장⁄ 2015.01.15 08:58:16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CNB저널 = 김맹녕 골프여행사진작가협회 회장) 2015년 을미년(乙未年) ‘양(羊)의 해(Year of the Goat or Sheep)’ 아침이 밝았다. 양은 온순하며 참을성 있는 동물로 평화를 상징한다. 또한 인간에게 털이나 고기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골프장에서도 대단히 유용한 동물이다.
네팔이나 인도의 오지에서는 비싼 기름 때문에 잔디 깎는 기계를 구입해 사용하기 힘들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처럼 겨울철 비가 장기간 내리는 코스에서는 잔디가 질퍽거리고 약해져 기계로 풀을 깎을 수 없다. 이런 곳에서는 양 무리를 잔디에 풀어놔 풀을 뜯어 먹게 하는데, 그 대표적인 골프장이 네팔의 ‘히말라야 골프클럽(Himalayan Golf Club)’이다.
히말라야 골프장은 해발 250피트 지표면 아래에 있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극한 코스로 유명하다. 한탄강 계곡보다 더 깊은 협곡 안에 만들어놓은 전장 3400야드 9홀 코스다. 클럽하우스는 절벽 위에 있으며, 250피트 계곡 밑으로는 큰 개천을 중심으로 지그재그형의 홀들이 펼쳐져 있다.

▲아름다운 마차푸차르 설산이 코스 뒤로 서 있다. 사진제공 = 히말라야 골프클럽
이 골프장은 전 영국군 소령 R.B. 구룽(Gurung)이 3년여에 걸쳐 자갈밭과 갈대밭을 일구어 스코틀랜드식 링크스 스타일 코스로 만들었다. 레이아웃을 보면 큰 개천을 건너 티샷을 날려야 하고, 보이지 않는 언덕 구릉 밑의 페어웨이를 향해 세컨 샷을 해야 하는 만큼 스릴만점의 홀이 연속된다. 그린 주변은 철조망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곳도 있다. 물소를 막는 방어벽이다.
9번 홀에 도착하니 양떼 200여 마리가 티잉그라운드 옆 우리에 갇혀 있다. “골프장에 무슨 양떼냐?”라고 지배인에게 물으니 “코스 정비를 위해 하루 굶겨 놓은 상태”라고 한다. 지배인은 “양이 하루를 굶으면 풀을 뜯으면서 배설물을 코스에 배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린 주변의 양떼들. 사진 = 김의나
네팔은 수송수단이 열악해 기름 값이 비싸고, 잔디 깎는 기계차의 마련 역시 쉽지 않다. 그래서 양이나 소 같은 가축을 키우면서 골프장 잔디를 관리하면 일거양득이라고 자랑한다. 단 양의 습성을 잘 알아야 한다. 양은 무리지어 군집생활을 하면서 동료 간 우위 다툼도 한다. 양은 반드시 가던 길을 되돌아오는 고지식한 습성도 있다. 그러나 착하디착한 양도 성이 나면 참지 못하는 다혈질이므로 잘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티샷을 마치자 양들이 일제히 페어웨이로 달려나와 풀을 뜯기 시작한다. 양 치는 노인은 양들을 일렬로 세우고 밧줄을 양옆에서 두 명의 사동에게 잡도록 하더니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간다. 양이 지나간 자리를 보니 아주 깨끗하게 풀이 깎여 있다. 그린 주변에 다다르면 양들을 자유스럽게 풀어놓는다.

▲히말라야 골프 코스 전경. 사진제공 = 히말라야 골프클럽
세컨 샷을 해야 하는데 “혹시나 양이 맞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자 지배인은 “양은 털이 많고 머리는 돌처럼 딱딱해 공에 맞아도 상처를 입지 않으니 마음 놓고 쳐라”고 한다.
전 세계 골프장 숫자는 5000여 개를 넘는다고 한다. 이 가운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오지에 골프장을 만들고 정원 같이 잘 정리된 곳은 이색적이고 추억에 남는 라운드를 제공하니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이색 골프장이어서 그런지 전 세계 골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린피도 18홀에 미화 50달러라니 네팔 국민의 연간 소득에 비하면 꽤 비싼 편이다.

▲양과 함께 골프를 즐기는 필자. 사진 = 김의나
라운드를 하면서 병풍처럼 둘러싼 눈 덮인 히말라야 산맥을 바라보면 저절로 입이 딱 벌어진다. 정면에는 높이 6998m의 마차푸차르(Machhapuchhare), 일명 물고기 꼬리를 뜻하는 피시 테일(fish tail) 산, 옆으로는 8091m의 안나푸르나 설산이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물론 이곳은 골프코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열악하다. 그린의 크기도 너무 작고 페어웨이 관리도 최악이다. 한 가지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순수한 자연 위에 만들어진 골프코스인 데다 소나 양과 함께 라운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리 = 박현준 기자)
- 관련태그
-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