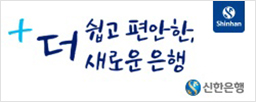▲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필자는 강의하는 것을 좋아하고, 강의를 통해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창업자들을 상대로 법률 관련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날 필자가 계약서와 관련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계약서의 제목입니다. 필자는 실제로 계약서의 제목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놓고 상대방과 언쟁하다가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계약서의 제목은 생각보다 민감한 문제입니다.
계약서의 제목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계약서의 제목으로 계약 내용을 짐작합니다. 그러다보니 계약서 작성자의 입장에서 계약서의 제목을 법률 용어를 사용해 멋있게 쓰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제목에 법률용어 꼭 사용할 필요 없어 더구나 계약서의 제목은 그 계약의 내용을 한 번에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상부에 보고하기도 매우 수월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과정에서도 적절한 제목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 모로 편리한 것은 맞습니다.
더구나 계약서의 제목은 그 계약의 내용을 한 번에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상부에 보고하기도 매우 수월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과정에서도 적절한 제목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 모로 편리한 것은 맞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14가지의 계약을 예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를 ‘전형 계약’이라고 하는데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 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계약 등입니다. 이런 민법상의 계약 유형은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위의 예시 중 하나를 골라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계약에 여러 가지 형태의 내용이 들어 있는 계약서도 많기 때문에, 하나를 골라 쓰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계약 내용의 가장 주된 부분 또는 계약의 목적이 되는 부분을 제목으로 뽑으면 됩니다. ‘영상물 제작 계약서’ ‘저작권 양도 계약서’ ‘출판 계약서’ ‘인테리어 계약서’ 등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제목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면 그냥 ‘계약서’라고 쓰면 됩니다.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계약서는 제목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민법 교과서에는 계약(契約)을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 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핵심은 계약 당사자의 의사입니다. 양 당사자의 의사가 기록된 서류라면, 제목이 있든 없던 그것은 계약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근거로 계약의 성립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합의서, 약정서, 양해각서 등 어떤 제목으로 작성하든 간에 내용이 어떤 것인지가 그 문서의 효력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실제 협상 과정에서는 제목을 어떻게 정하는지, 어느 당사자가 계약서의 표기에서 ‘갑’이 되고, 어느 당사자가 ‘을’이 되는지 미묘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상사들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실무자들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목 또는 갑을 신경쓰다가
정작 내용에 허점 남겨 놓으면 낭패
아무래도 필자는 계약서 작성 실무자들과 이야기할 경우가 많은데, 상사의 요구라고 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문구에 집착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약서의 중요한 부분에는 ‘너무 빡빡하게 작성하면 안 된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면서 허술하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정말로 회사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것은 계약서의 내용을 잘 구성하는 것입니다. 계약은 결국 협상입니다. 이 경우 실리를 취하려면 자신이 계약서에 ‘을’로 표시되든, 계약서의 제목이 무엇이 되든 상관없이 계약서의 내용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계약 조항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계약서의 제목이 아니라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은 잘 이행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계약이 틀어지게 되면 그동안 계약서에서 신경을 쓰지 않았던 조항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잘 만든 계약서, 정확히는 우리 회사에 유리한 계약서의 진짜 가치는 이때 나타납니다.
(정리 = 안창현 기자)
- 관련태그
-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제427호
제4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