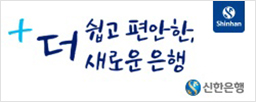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CNB저널 =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4일차 (모스타르 → 두브로브니크, 크로아티아)
사연 많은 도시를 떠나다
이름 모를 감회에 쌓여 모스타르를 떠난다. 버스터미널에 가려고 호텔을 나서는 새벽길, 네레트바 강물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협곡을 흐른다. 호젓한 골목에서 마주친 무슬림 노파가 표정 없이 스치고 지나간다. 뜻 없는 아침인사라도 내가 먼저 건넸어야 하는데 아쉽다. 노파의 무표정한 얼굴은 각박한 삶과 전쟁으로 잃은 인간에 대한 신뢰 때문이라고 넘겨짚어 본다. 버스터미널에서는 아침부터 구슬픈 노랫가락이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오니, 이 도시에 겹겹이 쌓인 애절한 사연들을 말해주는 것 같다.
간신히 내륙국을 면한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행 버스는 거의 만석이다. 교통 인프라가 불량한 발칸에서는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아 버스는 대개 만석으로 운행된다. 동유럽하고도 발칸의 산촌 풍경을 차창으로 맛보며 남행하다가 크로아티아 땅에 들어오는가 싶더니 다시 보스니아 땅이다. 과거 이 지역을 통치하던 라구사공화국(Republic of Ragusa)이 국가 난국을 타개하려고 오토만제국에게 팔았던 땅이었음을 내세워, 유고연방 해체 이후 보스니아가 달마티아 해안 도시 네움(Neum)에 대한 소유권을 관철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스니아는 간신히 내륙국을 면하고 아드리아해 연안을 쐐기처럼 파고들어 24.5km의 해안선을 확보했다. 그러나 크로아티아는 보스니아에 의해서 국토가 분리된 비지국(飛地國)이 되고 말았다. 때문에 버스는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의 경계를 두 번씩이나 들락거리며 더디게 진행한다.
해안 절벽에 매달려 자리 잡은 도시들
네움에서 드디어 아드리아해 달마티아(Dalmatia) 해안을 만났다. 험준한 절벽 위에 대롱대롱 걸린 것 같은 도시에서 좁고 깊게 파고 들어온 해안선이 한눈에 들어온다. 창밖으로 아드리아해를 보며 절벽길을 한 시간 더 달려 두브로브니크에 도착했다.
버스터미널 부근에서 가파른 언덕길을 숨이 턱에 찰 때까지 올라온 곳에 자리 잡은 숙소는 소박하지만 아래로 크루즈 부두를 내려다보는 풍경을 선사하니 지중해 어디쯤 와있는 것 같은 멋진 분위기를 낸다. 마침 거대한 크루즈 한 척이 출항한다. 배 위에서 바라보는 도시 풍경이 멋질 것이다. 가파른 절벽으로 이어지는 달마티아 해안에서 도시들은 반드시 언덕을 따라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두브로브니크를 방문한 사람들이 거리를 거닐고 있다. 그 뒤로 자연 경관이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다. 사진 = 김현주
인구 428만 명의 대부분이 가톨릭을 믿는 크로아티아는 1인당 소득 1만 8000달러로 발칸에서는 가장 잘사는 나라 중 하나다. 1991년 유고연방에서 독립했고 2013년에는 유럽연합(EU)에 가입했다. 해양왕국, 아드리아해의 진주, 혹은 크로아티아의 아테네라고 불리는 두브로브니크(Dubrovnik)는 중세 이후 라구사공화국(Republic of Ragusa)의 수도로서 해양에서 축적한 부와 명민한 외교 수완으로 이름을 떨쳤다.
십자군 전쟁(1205~1358) 이후 잠시 베네치아 왕국의 통치를 받기도 했으나 곧 독립해 1808년 나폴레옹 침입까지 줄곧 독립을 유지했다. 아드리아해로 진출하려는 오토만 세력과 이를 저지하려는 베네치아 왕국 사이의 긴장 관계를 잘 이용했던 것이다. 오토만제국에게는 조공을 바치며 적절히 관계를 유지했고 15~16세기 이후에는 베네치아 왕국과 경쟁 관계에 서기도 했을 정도였다.

▲두브로브니크를 멀리서 바라본 모습. 두브로브니크는 중세 이후 라구사공화국의 수도로서 해양에서 축적한 부와 명민한 외교 수완으로 이름을 떨친 곳이다. 사진 = 김현주
시내버스로 성곽도시(walled city)의 서쪽 입구인 필레게이트(Pile Gate)에 도착했다. 성곽도시 내 올드타운으로 들어가는 세 개의 출입구 중 중심광장으로 곧장 이어지는 필레게이트 앞은 오늘도 수많은 관광객들로 붐빈다.
크로아티아는 국내총생산(GDP)의 20%가 관광 수입이고 서비스 산업 의존도가 67%에 달하는 나라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7곳, 무형문화유산 또한 10개를 올려놓고 있는 나라 아닌가? 연간 1000만 명이 찾는 관광대국 크로아티아는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어서 아시아 방문자들 중에는 한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아 보인다.

▲두브로브니크 항구에 크루즈가 정착해 있다. 지중해 어디로 떠나는 크루즈일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사진 = 김현주
먼저 길이 2km의 성곽 위로 오른다. 육상과 해상에서 오는 적을 방어하기 위해 베네치아 왕국 시절 건설한 성곽 보도를 걷자니 건너편 산과 바다, 그리고 성곽 바로 밑 올드타운의 갖가지 풍경이 번갈아 다가와 눈이 쉴 틈을 허락하지 않는다.
세계 10대 성곽도시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압도적인 풍경이다. 성곽 내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중 더러는 관광객 숙소 영업을 하니 음식점과 기념품점 또한 쉬지 않고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세계적인 관광도시답게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외국어에도 능통해서 국민의 78%가 한 개 이상의 외국어를 할 줄 안다고 한다.

▲두브로브니크 올드타운 전경. 수도원, 성당, 유대교당과 세르비아 정교회당까지 있다. 사진 = 김현주
올드타운에는 수도원, 성당, 심지어 유대교당과 세르비아 정교회당도 있다. 15세기말 이베리아 반도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은 이곳에 게토를 형성하고 거주하기 시작했다. 다만 2차 대전 중 나치 괴뢰정권의 박해로 3만 9000명의 유대인 중 9000명만이 살아남아 두브로브니크 역사에 오점을 남긴 것은 두고두고 안타깝다.

▲세계 10대 성곽 도시인 두브로브니크는 어느 곳을 걸어도 성곽이 눈에 들어온다. 사진 = 김현주
올드타운에서 숙소로 돌아올 때는 천천히 걸어서 왔다. 짙푸른 아드리아해를 실컷 보기 위해서다. 오래된 저택들이 늘어선 나지막한 언덕을 오르내리는 꽃길은 걷기에 그만이다. 가끔 그늘을 만나면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바닷바람을 쐬며 참으로 여유로운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
“지상 낙원을 원한다면 두브로브니크에 오라”고 말한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와 두브로브니크를 사랑한 끝에 명예시민이 된 고(故)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마음을 헤아리고도 남겠다. 수많은 크고 작은 해변과 명징한 바다, 지중해의 온화한 기후와 달마티아 해안의 수려한 자연 풍광까지 겹쳐 인구 4만 남짓한 도시는 전 세계로부터 연간 수백 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인다.
(정리 = 김금영 기자)
- 관련태그
-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제481-482호
제481-48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