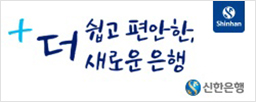▲‘공간 그리고 빛’전 전시장 일부. 사진 = 김금영 기자
(CNB저널 = 김금영 기자) 어떤 한 공간이 있다. 이 공간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둔 전시들이 비슷한 시기에 열려 눈길을 끈다. 한 전시는 빛의 스며듦과 사라짐으로 인해 변화되는 공간의 모습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 빛의 상징적 의미에도 의미를 두면서, 빛과 공간이 보여줄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다른 전시는 공간, 그리고 비공간 사이 지점에서 새로운 이야기 거리를 던진다. 그리고 그 지점에 있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전시장에 꺼내 놓는다.
빛이 만드는 공간 모습에 초점
‘공간 그리고 빛’전
전시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환한 빛이 가득 들어선 광경이다. 63빌딩 꼭대기 전망대에 위치한 전시장의 특성이기도 하다. ‘공간 그리고 빛’전은 63아트 미술관이 2016년 봄 첫 기획 전시로 선보이는, 뉴 아티스트 프로젝트 전시의 일환이다. 미술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역량 있는 작가를 매년 두 명 선발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2년 1회 ‘공간 그리고 풍경’, 2014년 2회 ‘낯선 공간, 낯선 풍경’에 이은 세 번째 전시다. 첫 회부터 ‘공간’을 주요 주제로 다뤘다. 이와 관련해 권아름 학예연구사는 “63아트 미술관은 여타 전시 공간과 달리 하늘과 가까운 높은 공간에서 주변 지역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특색을 지녔다. 이런 공간의 특색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작품을 소개하고 싶어 공간을 주제로 전시를 이어왔다. 첫 전시에서는 바깥의 경관까지 주목했고, 두 번째 전시에서는 실제 보지 못했던 낯선 공간의 풍경을 다뤘다”고 말했다.

▲김현정, ‘노래를 위한 숲’. 캔버스에 유채, 162.1 x 130.3cm. 2014. 사진 = 63아트 미술관
먼저 환한 빛과 함께 하는 김현정의 전시가 주목하는 공간은 바로 자신의 일상 풍경이다. 일상 풍경을 다루는 만큼, 왠지 모르게 친숙해 보이는 장소가 캔버스에 등장한다. 골목길의 계단과 큰 빌딩 근처에 늘어선 나무 등 친숙한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낯선 느낌도 드는 묘한 풍경을 그린다. 물감을 얇게 쌓아 올리는 글레이징 기법으로 이런 풍경들을 묘사한다. 여러 번 반복되는 붓질로 자신이 마주했던 풍경에서 느꼈던 기억과 감정을 더듬어 간다.
이제의 전시 공간은 김현정의 공간과는 정반대로 반전된다. 창문이 없는,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공간에 자신의 작품을 건다. 그리고 이 작품은 처음의 환한 전시장과는 전혀 다른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이중적인 매력을 선사한다. 이 암흑 공간에서 이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최초의 밤’ 풍경이다. 빛이 결여된 밤의 기억, 그 기억이 자리 잡은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곳에선 시각보다는 후각, 청각, 촉각이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런 감각이 집합된 풍경을 마주할 수 있다. 그리고 빛이 사라지는 밤의 시간, 이를 대신해 존재와 흔적을 밝히는 조명, 사람의 온기 등을 추상적이고 감각적인 형태로 표현한다.
세 번째 전시 공간은 어두움에서 밝은 단계로 가는 과정의 중간 단계의 느낌이다. 안경수의 공간에서는 작가 주변의 장소들이 등장한다. 그는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 사이의 경계에 집중한다. 예를 들어 풀이 무성하게 자란, 폐허와 비슷한 공터 뒤로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비치는 식이다. 낮 동안의 빛이 사라지고, 밤이 시작되는 경계에 나타나는 미묘한 빛의 변화, 그로 인해 달라지는 공간의 모습을 끊임없이 탐구한다.

▲노상준, ‘오아시스’. 캔버스에 혼합 재료, 100 x 100 x 20cm. 2012. 사진 = 63아트 미술관
63 아트 측은 “구조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간과 공간을 인지하게 하는 빛은 모든 작업에서 기본이 되는 요소다. 오랜 시간 많은 작가들은 공간과 빛을 탐구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표현을 시도했다”며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네 작가 또한 공간과 빛을 다양한 해석과 저마다의 개성으로 작업했다”고 밝혔다. 전시는 63아트 미술관에서 6월 19일까지.
공간과 비(非)공간 사이의 이야기
‘비-공간’전
‘공간 그리고 빛’전이 빛에 의해 시시각각 달라지는 공간을 바라봤다면, ‘비-공간’전은 장소적인 개념,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접근하는 측면이 강하다. 주도양, 노바디가 참여해 기존 정형화된 공간 논리에서 벗어난, 다양한 시점으로 바라본 공간을 전시장에 재구성한다. 그리고 이들이 동시에 주목하는 공간, 즉 장소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다.
갤러리 토스트 측은 “최근 DDP를 설계한 자하 하디드가 별세하면서, 이 공간은 보다 큰 의미를 갖게 됐다. 설립 시점부터 논란이 많았던 이곳은 이제 희소성의 의미까지 부여 받으면서 장소의 특색을 더하게 됐다”며 “두 작가는 현 시대 많은 이야기 거리를 제공하는 DDP에 주목했다. 주도양은 필름에 수채화를 입히는 방식으로 독특한 DDP를 재구성하고, 노바디는 이 장소가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폭력성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밝혔다.

▲갤러리토스트의 ‘비-공간’전에 설치된 주도양 작가의 작품. 사진 = 김금영 기자
그는 예로 프랑스의 에펠탑과 오르세 미술관을 들었다. 주도양은 “이 장소들은 사적이라기보다 공공장소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을 구경하기 위해 들렀다가 사라진다. 이처럼 잠시 머물렀다 가는 정도의 장소가 과거엔 손에 꼽을 정도였지만, 요즘은 넘쳐나는 세상이다. 이 가운데 과연 이곳들이 장소성이 기반이 된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비-공간’의 이야기가 논의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노바디, ‘노바디의 섬(The Isle of Nobody) 시리즈’. 디지털 C-프린트, 30 x 30cm. 2016.
이 가운데 두 작가는 이런 복합적인 특성을 살필 수 있는 공간으로 DDP를 택했다. 설립 당시 가상공간과도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장소다. 고층 빌딩이 늘어선 서울 도심 한복판에, 곡선 형태의 공간이 등장하자 이질적인 공간이 탄생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주도양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공공장소인 이곳을 왜곡된 시점으로 바라보는 시도를 했다. 이미지의 질서를 드러내는 원근법을 탈피해 복수의 시각으로 여러 개의 시점을 한 공간 속에 재구성했다. 특이하게도 정상적인 네모 상자가 아닌, 자체로 휘어진 듯한 곡선 이미지가 특징인 이 공간은 왜곡에 왜곡이 더해져 오히려 평면적인 이미지가 나오는 결과를 보였다.
주도양이 공간의 장소성에 집중해 이야기를 풀어내는 가운데, 노바디는 또 다른 측면에 접근한다. 공간과 사람과의 관계다. 앞서 언급됐듯 오제는 ‘비-공간’을 사람간의 관계가 부재된 비인간적인 장소라고 이야기했다. 노바디가 이런 측면을 발견한 건 DDP의 각종 문구들이다. 그가 찍은 DDP 사진엔 K5, K9 등 알 수 없는 문구를 위에 달고 있는 장소들이 보인다.

▲노바디는 특정 공공장소가 가질 수 있는 폭력성에 주목한다. 사진 = 갤러리 토스트
이어 “작가는 비-공간을 구성하는 이미지나 텍스트, 각종 코드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장소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리고 그에 따른 인간과 공간 간의 상호작용에 집중한다. 여기서 공간이 지배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험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시는 갤러리 토스트에서 4월 17일까지.
- 관련태그
-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제478호
제478호